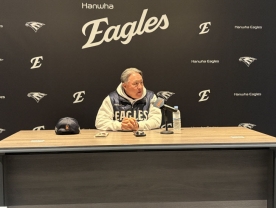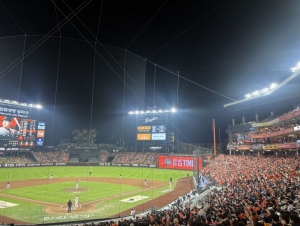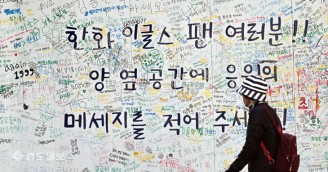|
| 박정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사업화실장 |
뉴스페이스란 정부 중심의 우주개발 시대를 넘어, 민간이 주도적으로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우주개발에 NASA, ESA 등 국가기관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발사체를 개발하고 위성을 운영하며 심지어 우주 관광과 달 탐사를 실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혁신의 출발점이 '창의성'이었다는 점이다. 스페이스X의 첫 로켓 '팰컨 1'(Falcon 1)은 단지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인류를 화성에 거주시키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시작점이었다. 블루오리진의 비전인 '우주에서의 인류 생존 공간 창조' 또한 현실적 사업모델이 아니라 상상력에서 출발한 선언에 가까웠다. 즉, 우주 혁신은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창의성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픽사(Pixar)의 공동 창립자 에드 캣멀(Ed Catmull)은 '창의성을 지휘하라'(Creativity, Inc.)에서 창의성은 천재 한 사람의 번뜩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하며 만들어지는 협력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그는 창의성을 문화적 시스템으로 바라봤다. 픽사는 사무실 구조부터 회의 방식까지 모두 창의적 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설계했다. 이 철학은 NASA의 혁신 문화와도 맞닿아 있다.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에는 수천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근무하지만, 단 하나의 중앙 카페테리아만 운영한다. 이는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세렌디피티'(Serendipity) 즉, 우연한 만남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창의적 순간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다. 서로 다른 전공의 연구자가 식사 중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발상이 나오곤 한다. 또한 NASA 에임즈(Ames) 연구센터는 매달 '센터 해피아워'(Center Happy Hour)를 연다. 연구자, 기술자, 행정직원들이 함께 모여 다과를 즐기며 격식을 벗어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연구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이는 조직의 위계나 부서의 경계를 허물고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창의성의 장으로 기능한다.
우리나라 우주개발도 이러한 문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추격하는 것에는 강하지만 창의성의 시스템화에는 아직 약하다. 위성, 발사체, 우주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서로의 생각이 섞이고 부딪히는 융합과 창의성의 공간이 협소한 면이 있다. 이제 우주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창의적 우연'을 촉발하는 장을 확대할 때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할 수 있는 공간, 기관 간 장벽을 낮춘 협업 프로그램, 그리고 실험적 문화 촉진 등이 그 예다.
에드 캣멀은 좋은 아이디어는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꿈꾸는 우주도 마찬가지다. 창의적 발견은 천재 한 명의 머릿속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마주치고, 충돌하고, 뒤섞이는 곳에서 비로소 태어난다. 우주개발은 '창의성'을 경쟁력으로 삼아 왔고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뉴스페이스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로켓과 위성보다 먼저 상상력을 쏘아 올릴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우주의 무대 위에서 스페이스 오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사업화실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