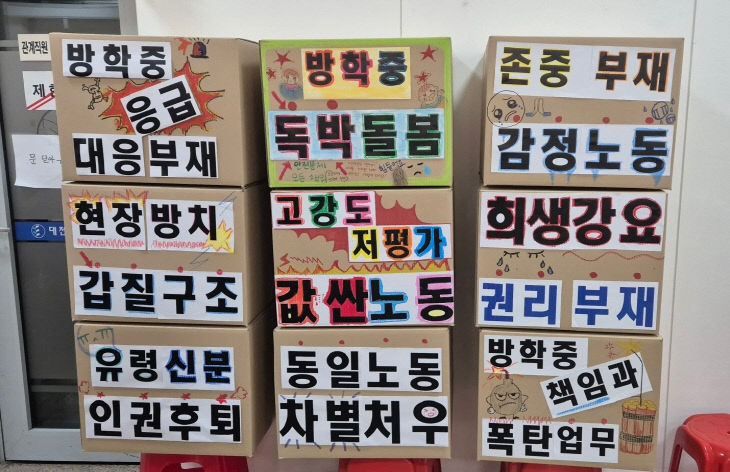(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오송KTX 역세권 개발에 참여하겠다며 컨소시엄 두 곳이 나섰다.
어느 한 쪽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충북도가 오송신도시 건설 기본계획안을 내놓은 2005년 10월 이후 8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역세권은 개발의 단비를 맞게 된다.
그러나 개발 전망은 밝지 않다.
이들 컨소시엄이 무리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시공권을 달라거나 자신들의 손해가 없도록 채무 보증을 서달라는 것이 투자 조건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 민·관 합동 방식의 도내 개발사업 가운데 여태껏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조만간 열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심의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 "이득은 업체가, 손해는 충북도가"
한 달간의 공모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오후 늦게 금융·건설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도 출자기관인 충북개발공사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도의 채무 보증과 함께 미분양 용지를 도가 100% 인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분양으로 발생할 손해를 도가 전부 떠안으라는 얘기로 보인다.
건설분야의 한 전문가는 "미분양 용지에 대해 자치단체가 참여지분인 51% 만큼을 책임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민간 파트너가 미분양 용지든, 빚이든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오른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보다 조건이 더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청주시는 산업용지 책임분양 약속에 이어 자금 대출 이후 16개월 이내에 보상, 이주, 문화재 발굴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대주단에 추가 약속해 PF 대출을 성사시켰는데 일부로부터 '노예계약'이라는 시선을 받았다.
미분양 용지를 자치단체가 인수해 달라는 이 컨소시엄의 요구는 청주테크노폴리스사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채무 보증은 수위를 한층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 "두 컨소시엄 '부적격' 가능성 커"
지난달 26일 사업계획서를 일찌감치 제출한 또 다른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부정적 관측이 제기되기는 마찬가지다.
도 출자기관인 충북개발공사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간 청주시와 청원군이 부담할 51%(1천582억)를 제외한 49%의 사업비를 댈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그러나 이 컨소시엄은 자치단체가 부담할 51%의 사업비를 자신들이 출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발 방식을 '부분 공영'에서 '민간사업자 개발'로 전환, 시공권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컨소시엄의 제안은 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계약법 상 입찰은 무조건 경쟁 입찰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 내용이 공모 기준을 벗어난 것이다. 적격성 심사 때 수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 전문가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자칫 수백억,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적격 결정이 나올 게 뻔하다"고 내다봤다.
ks@yna.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