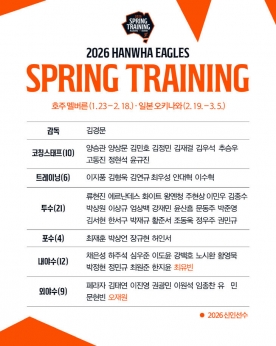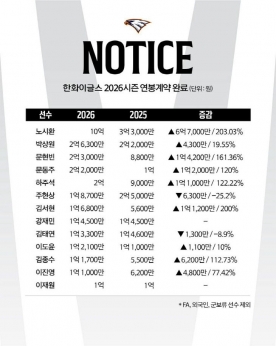|
문재학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실제인물이다. 문재학은 당시 고1 학생으로 사상자를 돌보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 한강은 5월 문학의 대표적인 소설가다. 한강에 앞서 임철우도 평생 5·18광주민중항쟁에 천착했다. 대학시절 내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된 소설이 임철우의 '붉은방'이었다. 사방이 핏빛의 붉은 페인트로 칠해진 방에서 고문하는 자와 고문당하는 자의 폭력과 공포가 뭉크의 '절규'를 떠올리게 했다.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는 분단체제로 인한 폭력과 광기다. 하지만 이 작품의 보이지 않는 배경은 1980년 5월 당시의 폭력과 광기 그리고 군사독재 체제에 대한 개인의 무기력이다. '붉은방'이라는 공간 속에서 고문이라는 무서운 주제를 작가는 서정적인 문체로 폭력을 묘사한다. 문학평론가 김현은 이 소설을 '아름다운 무서운 세계'라고 했다. '붉은방'을 대학 도서관에서 읽고 나는 열에 들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심장이 방망이질 쳤다. 섬뜩했다. 그 후 며칠동안 나는 몸살을 앓았다.
묘지를 둘러보는데 몇명의 나이 지긋한 남자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노태우의 아들 노재헌씨였다. 아버지의 얼굴을 빼닮아 한 눈에 알아봤다. 그 아들이 머리가 하얀 초로에 접어들었다. 국화꽃바구니에 달린 리본엔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노재헌'이라고 쓰여 있었다. 몇 년 전 이곳에 와서 참배해 기사화된 인물이었다. 당시 노재헌씨는 아버지 노태우가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밝혔다. 살아생전 본인이 직접 사죄했으면. 악의 화신 전두환의 자식들은 말 한마디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던가.
점심 때가 훌쩍 지나 광주송정역 앞 '1913 송정역시장'으로 갔다. 점심을 거른 터라 배가 홀쭉했다. 평일이라 시장은 한가했다.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다 한 곳이 눈에 들어왔다. 상호가 '국수집'이었다. 메뉴에 주먹밥도 있었다. 그런데 문이 잠겼다. 확인해보니 주인이 일이 있어 4시에 온다고. 아, 기차시간은 5시 13분인데. 전화를 걸어 주인한테 사정을 얘기하자 되도록 빨리 오겠다고 상냥하게 말했다. 우선 손바닥 만한 수제 초코파이와 고로케로 허기를 달랬다. 잠시 뒤 국수집 주인이 왔다. 잔치국수와 주먹밥 2인분을 시계를 보면서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먹었다. 광주의 주먹밥은 특별하다. 5월의 시민군이 광주를 지킬 수 있었던 데에는 주먹밥의 힘이 컸다. 소금 간만 한 밥을 뭉쳐 김에 싼 소박한 주먹밥. 금남로에서 광주의 어머니들이 시민군을 응원하며 건넨 주먹밥. 이 주먹밥이 12·3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 최악의 영남 산불에서도 빛을 발했다. 분노의 길거리에서 시민들의 허기를 면해주고 터전을 잃은 산불 이재민에게 위로가 됐다. 기억의 힘이고 연대의 힘이다. 주먹밥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지방부장>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우난순 기자
우난순 기자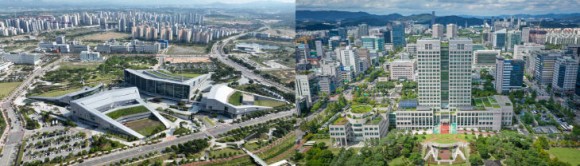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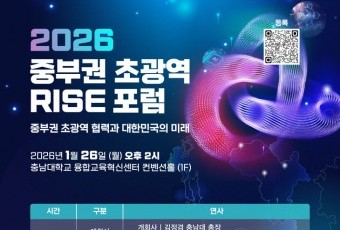


![[주말날씨] 충청권 강추위 계속… 때때로 눈비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1m/24d/78_2026012301001844500075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