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의 주된 명분은 이번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관련된 것이다. 책임총리제도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니다. 87체제(1987년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의 산물인 단임제 채택은 다른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그러하듯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 6월 항쟁 이후 국민적 의지와 염원으로 탄생했지만 이젠 수명이 다했다.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고 잘못하면 국가를 누란의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성에 거듭 노출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처럼 귀결된다. 정권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책임성이 강화될 테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정치적 불안정성을 줄이려면 대선과 총선, 혹은 지방선거의 '비동시 선거 주기'도 손봐야 한다. 행정부(대통령)와 입법부(국회)의 권력 충돌을 기능적으로 막는 방안도 개헌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다른 차원이지만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입법적 보완까지 검토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면면이 계승하면서 시대와 조응하는 헌법 정신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개헌의 필요성은 대통령이 비극적 결말을 반복하는 정치 체계를 바꾸는 데만 있지 않다.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가 모든 것은 아니다.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고 실질적 지방분권과 실제 세종 행정수도를 헌법으로 제도화하는 개헌도 꼭 성사시켜야 한다. 이 후보가 제시한 '삼권분립'의 가치를 세우는 일은 사실 기본적인 것이다. 개헌 성공 여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기존 10대 공약에 개헌 방향성이 담겨 있지도 않다. 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개헌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개헌 논의를 정략적인 카드로 쓰다 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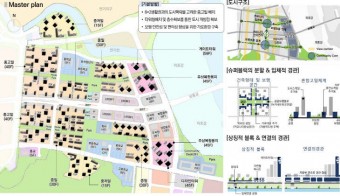










![[드림인대전] 초등생 윤여훈, 멀리뛰기 꿈을 향해 날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9m/01d/20250826010018644000791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