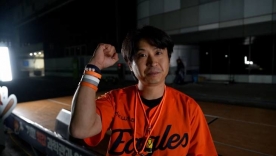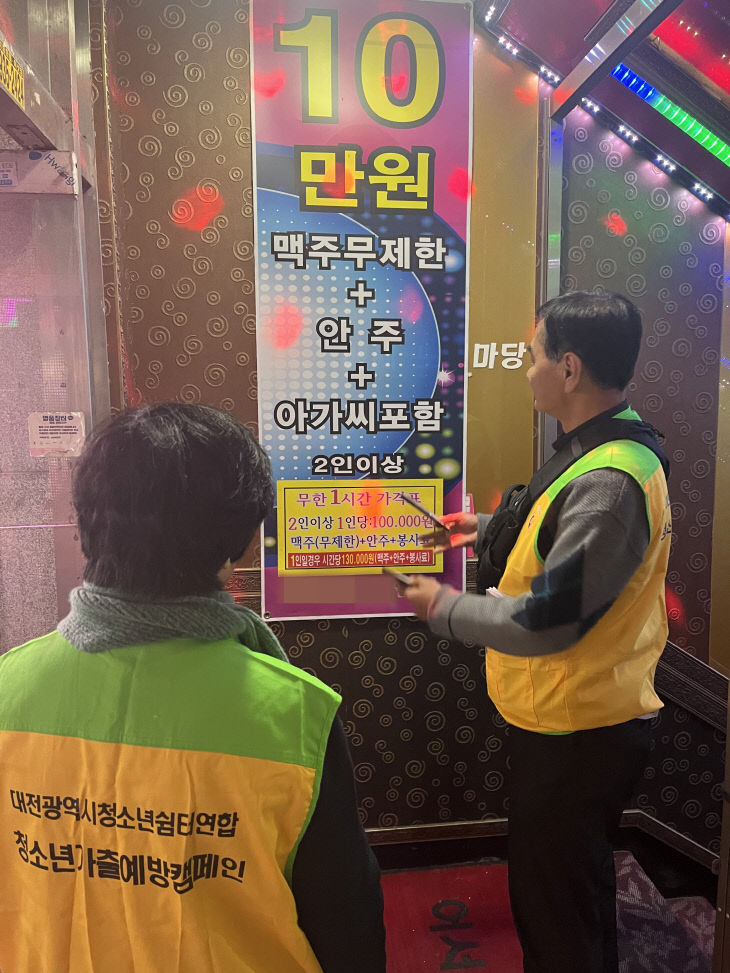|
|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통증의학과 김응돈 교수 |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우리 몸에 처음 감염 시는 수두를 일으키고 신경절에 잠복해 있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이 바이러스를 억제되지만 각종 질환,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일정 기준 이상 떨어지게 되면 다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대상포진을 일으키게 된다. 대상포진에 잘 걸리는 조건, 즉 위험인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다. 50세 이상, 여성인 경우,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면역 억제제 복용,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환경 등도 위험인자로 꼽을 수 있다.
대상포진의 대표적인 특징은 피부 증상이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감염시킨 신경절을 따라서 점차 피부까지 이동하게 되고 이 신경절이 지배하는 피부 영역에 띠 모양의 수포와 같은 특징적인 병변과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대상포진 피부병변은 몸의 한쪽에서만 나타나게 된다.
대상포진 환자의 70~80%는 피부병변이 생기기 전에 전조증상이 먼저 온다. 찌르는 듯한, 쑤시는 듯한 통증과 가려움을 호소하고, 몸살감기처럼 근육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주로 2~3일에서 길게는 1주일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시기는 피부 병변이 없으므로 진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전구증상 시기가 지나면서 피부분절을 따라 홍반, 구진 등이 발생하게 되고 수포가 발생한다. 그러다가 3일 정도 후에 농포로 변하고 7일에서 10일째 가피, 즉 딱지가 앉게 된다. 2~3주 정도 지나서 딱지가 떨어지면서 피부병변은 치유되는 경과를 밟게 된다.
대상포진은 흔히들 걱정하는 것처럼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한 공기전염은 되지 않는다. 다만, 피부 진물이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타인의 점막을 통해 침투하게 된다면 수두의 형태로 발현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즉 피부에 딱지가 생기기 전까지는 전염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영유아, 임산부, 면역저하자와의 접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포진의 치료는 초기에 바이러스가 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포 발생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지속적인 통증 신호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신경계의 변성이 일어나게 된다. 한번 신경계의 변성이 일어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빠르고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요법을 사용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신경 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관건은 통증 신호가 지속적으로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신경계의 변성을 막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상포진의 후유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다. 쉽게 말해서 피부가 다 나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개 피부병변이 생긴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단계로 넘어갔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만성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보고 있고 이때부터는 난치성의 통증으로 바뀌게 된다.
70세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50% 정도 1년 뒤에도 통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급성기에 통증이 심할수록, 피부병변이 심할수록, 그리고 두경부 특히 안구부에 생겼을수록 통증이 잘 남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만성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들의 경우는 완치보다는 통증 관리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도 비록 계속 약을 복용하더라도 통증 관리가 잘 되면 얼마든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통증의학과 김응돈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꿀잼대전 힐링캠프 2차] 캠핑의 열정과 핼러윈의 즐거움이 만나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1m/03d/118_2025110301000092200003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