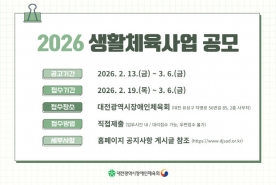|
| 당진 왜목하수욕장. (사진= 김영복 연구가) |
그저 꽃게를 보기 만해도 아들을 낳을 태몽 꿈이라니 밥상 위에 올려 진 꽃게를 맛있게 먹고 좋은 꿈을 꾸는 맛있는 상상을 하면서 이번 여행은 당진으로 '맛있는 여행'을 떠나 본다.
삼분지 이가 바다로 이루어 진 당진의 지역적 특성상 당진은 갯벌이 잘 형성되어 있고, 이 갯벌은 생명력 넘치는 곳이다. 넓고 드넓게 펼쳐진 갯벌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풍부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보고라 할 것이다.
특히 당진의 꽃게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해산물 중 하나로 서해의 맑은 바닷물과 갯벌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 꽃게는 알이 꽉 차고 살이 단단하며, 특유의 감칠맛으로 유명하다. 봄철 암꽃게의 알은 별미 중의 별미로 꼽히며, 식도락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옛날에 단오날이 오면 아낙네들은 떼를 지어 횟불을 들고 바닷가 갈대밭으로 들어가 함석물 초롱과 구덕에 게를 잡아넣었다.
게는 야행성이라 밤에 주로 활동하는데, 예전에는 바닷가 갈대밭에 횃불을 비춰가며 기어다니는 게를 잡아 통에 넣기만 해도 되었다.
충청도에서는 이것을 '해루질'경상도에서는 '홰바리' 지역에 따라 '화래지''화락질로도 불렸던 예전의 밤마실 행사였다.
지금이나 꽃게를 배를 타고 먼바다까지 나가 통발이나 유자망 그물로 잡지 예전에는 주로 꽃게를 '해루질'로 잡았다.
그러나 지금도 충청도나 경상도 해안가에서 '해루질'이나 '홰바리'를 하는 바닷가 전통 마을이 있는데, 충청도 서해안에서는 '해루질'을 해서 잡는 꽃게가 주로 비록 덩치는 작아도 성질이 사나운 흑갈색을 띤 '민꽃게'다.
충청도에서 '바카지'라 불리고 경상도에서는 '돌게'라 부르는데, 간장게장을 담거나 된장찌개를 끓인다.
충청도 서해안 바닷가의 밤마실'해루질'은 썰물이 많이 빠지는 15일과 30일 전후 사리물때의 간조가 이슥한 자정 무렵이 적기라 할 것이다.
요즘은 갯벌에서의'해루질'도 어업 행위이다 보니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해루질'에 사용 가능한 장비는 구명조끼를 입고 횃불 대신 랜턴, 투망, 족대, 반두, 수망, 가리, 외통발,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 상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
| 간장게장. (사진= 김영복 연구가) |
꽃게는 식용게로 가장 많이 이용되며 한국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시장에서 볼 수있다. 한국에서 꽃게의 제철은 암꽃게일 경우 4~6월, 숫꽃게일 경우 9~11월이다.
그리고 꽃게는 한자로 유모라고 하며, 강원도에서는 날개꽃게, 충청도에서는른다. 보통게와는 달리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서양에서 'swimming crab'이라고 한다.
꽃게는 다른 게들 처럼 암컷은 배가 둥글고 넓적하고, 수컷은 뾰족하다. 외포란 한 암컷은 잡으면 안되며, 금지체장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어기는 꽃게들의 번식시기인 6~8월이며 이 시기에도 꽃게를 잡으면 안된다. 꽃게는 가을은 암컷이 살이 없어 숫꽃게 철이고, 반대로 봄은 수컷이 살이 없어 암꽃게 철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이라고 부르는 부위는 꽃게의 난소이다.
등딱지 길이 7cm, 폭은 15cm 내외이고 몸빛은 머리와 가슴 부위, 그리고 넷째 다리가 푸른 빛을 띤 암자색 바탕에 힘구름 무늬가 있어 아름답다.
게의 배딱지는 일반적인 갑각류의 꼬리에 해당하는 부위다. 즉 몸통이 폴더폰마냥 접힌 상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항문과 생식 기관 역시 이 배딱지에 있으며, 항문의 경우 배딱지 끝에 있기 때문에 게는 입 바로 밑에 항문이 달린 꼴을 하고 있다. 알에서 갓 깨어난 유생 단계에서는 이 배가 새우처럼 완전히 펼쳐져 있다가, 성장하면 점점 납작해지며 접힌다. 이 배딱지로 게의 암수 구별을 하는데 암컷은 배딱지가 크고 넓어서 알을 붙잡고 있기 좋지만 수컷은 배딱지가 가늘고 조그맣다.
이마에는 양 눈앞가시 사이에 가시가 2개 있으며, 집게다리 긴 마디의 안쪽인 앞모서리에 예리한 가시가 네 개 있다. 집게발이 강대하고 멀리 이동도 하며 게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역시 양팔에 달린 집게발인데, 이는 몸을 방어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먹이를 분해하는 수저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꽃게의 다리의 개수는 10개이다. 6~7월에 알을 낳고 얕은 바다의 모래땅에 군서 생활을 한다. 깊이 2~30m 되는 바다 밑의 모래나 개펄 속에 산다.
 |
| 간장 게장. (사진= 김영복 연구가) |
게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요리로는 게장이라 할 것이다. 게(蟹)를 이용해 담는 게장은 해장(蟹醬), 해장(蟹腸), 해서(蟹胥), 해황(蟹黃) 등으 로 다양하게 불렸다.
게장이란 단어는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마도 1호선(1208년) 죽간(竹簡)에 쓰인 '해해'로 처음 등장한다.
중국 명(明)나라 시절 본초학자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이 엮은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게는 생으로 삶거나[生烹], 소금에 절이거나[鹽藏], 술지게미에 담아 두거나[糟收], 술에 담그거나[酒浸], 간장에 담그거나[醬汁浸] 모두 좋은 식품이 된다'고 했다.
세종(世宗)은 경기·충청·황해도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사옹방(司饔房)에서 여러 인원을 나누어 보내어 게를 잡아 젓을 담는데, 제원(諸員)이 진상(進上)을 칭탁하여 고기와 게를 도용하고, 혹은 처자를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로 사리를 영위해 민간에 폐를 끼치니, 추핵(推劾)해 아뢰라(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 27년(1445) 12월 21일)"고 했다.
이때도 이미 게장을 담아 즐겨 먹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조선 문종·세조·성종 때의 문신이며 학자였던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지은 '촌주팔영(村廚八詠)'이라는 연작시에는 게젓을 노래한 부분이 있으며, 홍만선(洪萬選, 1664∼1715)이 지은 『산림경제(山林經濟)』에 지게미게젓(糟蟹), 술게젓(酒蟹), 장초게젓(醬醋蟹), 장게젓(醬蟹), 법해(法蟹), 게젓(沈蟹), 약해(藥蟹) 등 다양한 게젓 조리법을 소개하고 있고,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손자인 오주(五洲) 이규경(李奎景, 1788~1863)이 지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도 게장 담그는 법이 소개된 것으로 보아 참게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 양념 게장. (사진= 김영복 연구가) |
조해법은 게 30마리에 술지게미 5되, 소금 2근, 초와 술 각 반 근을 담가 7일간 익힌다. 게를 깨끗이 씻은 뒤에 반나절이나 하루쯤 말려서는 볶은 소금 1근, 백반가루 1냥 5돈, 술 5 되에 담갔다가 익은 뒤에 건져 게 1마리에 통후추를 1알씩 게딱지 속에 넣고 딱지를 덮은 위에 후춧가루를 뿌려 다시 담가둔다.
장해법은 게 100마리면 간장 5되, 후춧가루 2냥, 술 1말에 담근다. 고기를 끓인 장조림 간장에 천초 등을 섞어 담그기도 한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10(1734)년 5월 24일 자를 보면 '사시(巳時)에 영조가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약방이 입진하러 입시한 자리에서 도제조 서명균(徐命均)은 왕에게 "흡곡현의 게장은 봄이 오면 바야흐로 간장에 담그는데,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일컫는 것입니다"라고 나온다.
조선 후기에, 장계향(張桂香, 1598~1680)이 쓴 국내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디미방(飮食知味方)』에는 소금물로 담근 '게젓'과 간장으로 담근 '약게젓(藥蟹)'이 나온다. 약게젓은 "게가 쉰 마리 정도이면 진간장 2되, 참기름 1되에 생강·후추·천초를 교합해 짜게 달여서 식히고, 게를 깨끗이 씻어 이틀 정도 굶겨서 그 국에 담가 익으면 쓴다"라고 나온다.
지금의 간장게장 담그는 법과 거의 같다. 게장을 담글 때 살아있는 참게에게 쇠고기를 먹여 키운 호사스러운 게장도 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암 홍만선 선생(1643~1715년)이 쓴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게장을 담는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홍만선 선생은 이 저서에서 게장 조리법을 간장으로 만드는 방법과 소금으로 만드는 방법 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간장게장과 달리 소금게장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 소금게장은 소금의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게살 속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간장게장에 비해 살이 단단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지금은 소금게장을 파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일부 지역에서는 어부들이 소금게장을 별미처럼 여기며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한다.
 |
| 게국지. (사진= 김영복 연구가) |
여기에는 '게 껍질에 밥을 담아 먹지 말라'는 대목이 나온다. 체면을 중시하는 선비조차게 껍질에 비벼 먹는 밥맛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 이러한 꽃게장의 맛으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당진포구 일대다.
특히 6월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봄철의 꽃게는 노란 알과 내장이 가득 차 있어 꽃게장을 담그기에 그만이다.
당진꽃게장이 맛있는 이유는 봄철에 갓 잡은 싱싱하고 알이 꽉 찬 암게만을 사용하고, 전통비법으로 간장을 만들어 게장을 담그기 때문이다. 또한 당진의 게 전문음식점에서는 꽃게를 잡자마자 산 채로 급속 냉동시켜 놓는데, 이렇게 냉동시켜 둔 암게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 물에 담갔다가 장을 담그면 사시사철 싱싱한 게를 맛볼 수 있다.
꽃게는 게장 이외에도 찜, 탕, 등으로 조리하며, 껍데기에는 아스타산틴(astaxanthin)이라는 물질이 있어 단백질과 결합하여 다양한 색을 내는데, 가열하면 결합이 끊어져 본래의 색인 붉은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삶으면 껍질이 붉은색을 띠게 된다.
김영복 식생활연구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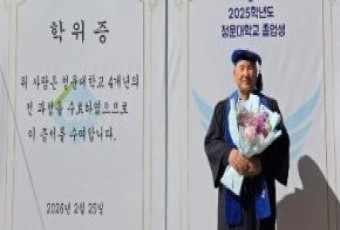











![[단독] `능력 없으면 관둬야`…대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논란](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2m/28d/20260225010017621000760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