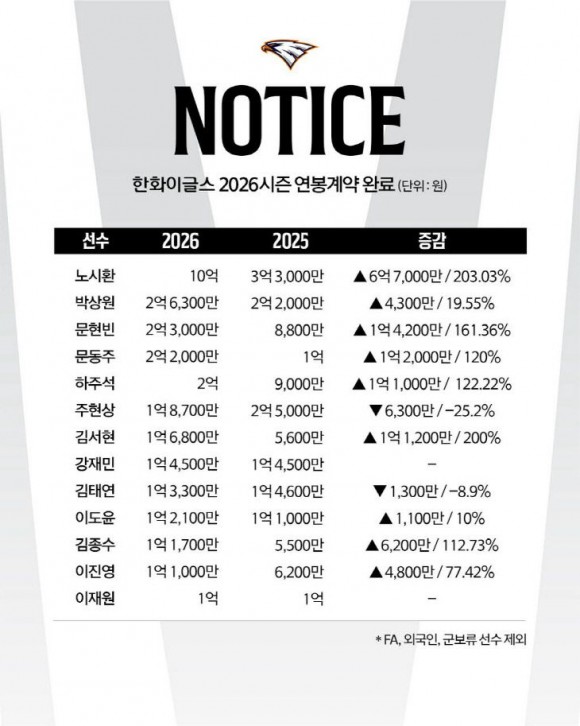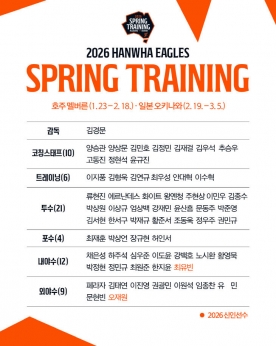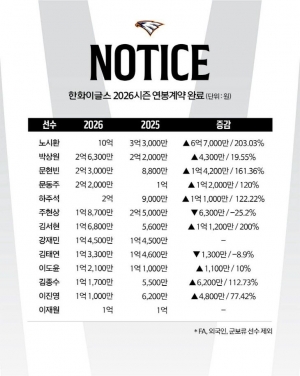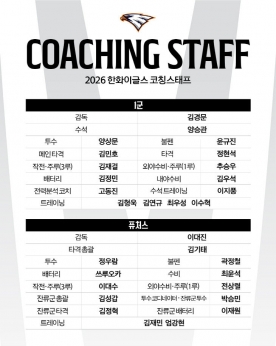|
| 김충일 북-칼럼니스트 |
한해의 반환점에서 서성거리다보니 지나간 일상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져 씁쓸한 기분에 빠지게 된다. 그런 시간 돌아보기는 모두가 겪게 되는 경험인데, 우리네 일상을 되 짚어보면 걱정한다고 회복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에 빠져들고 그 근심으로 인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조차 힘겨워하곤 한다. 남들은 괜찮다지만 수심(愁心)만 앞서고 나중에 돌아보면 결코 일어나지 않은 괜한 걱정 때문에 자신을 지치게 만든다.
이 때 구체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디테일한 현상은 공허한 지속을 잊기 위해 끝도 여명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 고뇌에 찬 이유를 알 수 없는(때론 인식하기도 하는) 불면의 깜짝 놀랄 만한 습격이다, 당연히 어느 정도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밤은 누구나 겪는 현상인데 이것은 급기야 일상의 모든 메커니즘을 중단시키며 자기만의 고통스런 방식으로 다가와 몸에 가하는 심적·신체적 폭력이다.
과연 불면의 시간이란 무엇일까? 원래 시간은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정적인 흔들림이지만, 그 안에는 구체적이며 새로운 생(生)이 동적으로 춤을 추는 이중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내 일상 속 '잠'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서 그냥 흘러 갈 것 같지만 '혼자만의 침대'에 격리 되어 있으면서도 '삶이 어떻게 조성(造成)되고 있는가?'란 결코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성찰의 계기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밤(어둠)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둠은 그 안에 벌써 역설적인 '먼동의 빛'을 품고 있다.
불면의 시간을 오래 겪다 보면 '살지도 못하고 내 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심리적 텅 빔 현상이 생겨난다. 시간은 원래 그냥 아무 것도 이룸이 없이 흐르는 것이 본질이건만 우리는 일상 속 흐르는 시간 안에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 한다. 내가 살아 있음을 시간에게 증명이라도 하듯이. 해서 우리는 채우려다보니 쫓기듯이 분주하게 살게 되고 결국 일상생활(생)은 헛된 시간의 흐름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소중한 깨우침을 잊곤 한다. 그러나 곰곰이 불면을 들여다보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은 이 공허한 시간의 공간 속에서 흘러간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불면의 시간은 내가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함 속에 머무르느라 게을리 했던 배반당한 나의 삶이 말을 거는 시간이다. '나를 살아줘'라는 요청이다. 그 삶이 구호요청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나는 나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채 결국 끝나게 되니 이럴 때, 우리는 불면 속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그만두고 반대되는 행동을 해보는 것이다. 즉 다 잊어버리고 빨리 잠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잠듦에의 욕망에서 벗어나 깨어남의 욕망에 불을 지피는 일이다. 이렇듯 불면의 시간은 우리를 성찰로 부르는 시간이다.
우리 일상 속 '어둠과 먼동의 빛'인 불면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친구가 되어 잘 지내보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불면 역시 그런 일 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넨다. 그걸 듣고 못 듣고는 우리 책임이다. 불면의 소리는 잠들라는 침잠의 울림이 아니라, 깨어나라는 각성의 외침인 것이다. 깨어나야 내가 원하는 할 일이 생긴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 이것이 '불면(不眠) 속 깨어있음이란 모순의 선물'이 아닐까.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