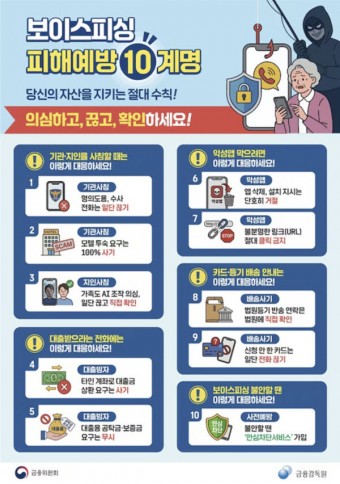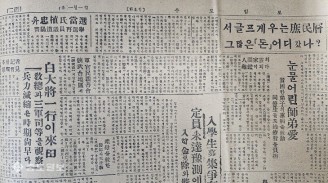|
| 담양 죽림재. (사진= 김영복 연구가) |
요즘 폭염과 폭우가 거듭되는 날씨 탓에 여름휴가를 즐기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번'맛있는 여행'은 남도의 자연을 오롯이 즐겨 볼 수 있는 담양으로 떠나보기로 한다.
담양하면 대나무를 연상 할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죽녹원(竹綠園)'이 있다.
2003년에 조성된'죽녹원'은 총 면적이 15만7천평에 달하는데, '죽녹원'에 들어서면 수령이 오래된 푸른 대나무들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이 들어서 바람에 흔들이며 빛의 향연을 펼치고 있으며, 대 숲 사이로 스치는 바람이 시원하게 땀을 식혀 준다.
죽녹원에서 자가용으로 3분거리에 위치한 관방제림 역시 산책하기 좋은 힐링의 명소라 하겠다.
이곳은 영산강의 지류인 담양천을 따라 2km 정도 조성된 제방 숲이다.
조선시대 하천이 넘쳐 수해가 발생하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인공으로 숲을 조성하면서 오늘의 모습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관방제림은 약 300여년 정도 된 느티나무, 팽나무, 굴참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여름에는 맑은 담양천과 함께 푸르른 녹음이 우거져 있다.
봄에는 홍매가 곱게 피고 여름에는 온통 배롱나무 꽃으로 수놓은 담양 죽림재(竹林齋)는 조선의 선비 문사들에게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했던 유서 깊은 증암천 옆 향백산 아래 고서면 분향리 잣정마을 창녕조씨(昌寧曹氏) 집성촌에 있다.
한여름 열기를 토해내듯 진분홍 빛을 찬란하게 뽐내는 배롱나무 꽃무리가 기품 있는 한옥과 어우러져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담양여행에서의 소쇄원(瀟灑園)은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다. 담양군 가사문학면 소쇄원길 17 에 위치한 소쇄원은 한국 민간정원 중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 받는 곳이며, 조선시대 선비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소였고 지금은 명승 40호로 지정되었다.
소쇄원(瀟灑園)에 들어서면 대나무의 고장답게 대나무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시원함과 운치를 더해 준다.
소쇄원의 면적은 약1400평 정도가 되며, 역시 이곳도 고풍스런 한옥과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소리 계절마다 피는 꽃들의 향연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기묘사화로 죽인을 당한 조광조의 제자 소쇄처사(瀟灑處士) 양산보(梁山甫, 1503~1557)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고향인 담양군 창평면으로 내려와 은둔하면서 지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는 담양읍 1.5km 길이의 숲길인 메타세쿼이아로 이다.
길 양쪽에는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늘어서 있어, 마치 동화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곳은 1970년대 초반에 가로수 시범사업으로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은 것이 시작이 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의 보존운동과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되었다.
메타세콰이어는 살아있는 화석식물로 불리는 전설의 나무로, 1억 년 전 백악기 공룡시대의 화석에서도 발견된 나무라고 한다.
메타세쿼이아 나무는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담양은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가장 많이 자생하는 곳 중 하나다.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봄에는 푸른 잎이 무성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며,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린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메타스퀘어길을 배경으로 한 메타 원목의 하트 모양 포토존은 누구나 한 번은 추억의 사진을 담고 가는 장소로, 연인끼리나 가족끼리 방문하기 좋다.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은 산책, 자전거 타기, 피크닉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도 인기가 많다.
 |
| 담양 신식당. (사진= 김영복 연구가) |
담양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은 대통밥, 떡갈비, 청운식당 피순대, 고서식당 돼지갈비짚불구이 등이 있지만 오늘은 떡갈비의 원조 신식당을 소개할까 한다.
떡갈비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담양 '신식당'은 요리솜씨가 남달리 좋은 창업주인 故 남광주 할머니가 담양으로 16세에 시집을 와 결혼 후 3년만에 마을 잔치가 있거나 고을 원님이 방문했을 때마다 음식을 담당하는 역활을 했다.
이후 1909년, 작으나마 식당을 꾸려 본격적으로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하였으니 무려 116년 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故 남광주 할머니 이후 며느리인 신금례(제2대) 할머니의 성을 따서 식당이름을 '신식당'이라 했으며, 신금례 2대 할머니의 며느리인 이화자(제3대) 씨가 식당을 이으면서 '갈비 모양이 마치 떡처럼 보인다'고 해서 손님들이 '떡갈비'라 이름을 붙여줬다고 한다.
'신식당'은 국내산 한우만을 고집하면서 올해 여든 두 살이 된 이화자 3대 며느리를 거쳐 제4대 한미희 며느리로 4대째 전통을 이어가는 '떡갈비의 본가'로 불려지고 있
'신식당'은 故 남광주 할머니의 손맛이 며느리인 故 신금례 할머니와 3대 이화자 할머니에 이어 증손자 며느리 한미희 씨에 이르기까지 4대를 잇고 있는데, '음식은 여자가 해야한다'는 관습으로 음식 맛과 식당의 역사가 모두 며느리들을 통해서 대물림하고 있다.
3일간 숙성시킨 갈비에 양념을 발라 만든 떡갈비는 육즙이 풍부하고 쫄깃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데, 수작업으로 얇게 펴서 만든 갈비라서 맛 자체가 부드럽고 담백한 게 특징이다. 故 남광주 씨는 예로부터 중요한 손님의 접대나 잔치 음식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떡갈비를 만들어 제공했다.
 |
| 담양신식당 떡갈비 차림. (사진= 김영복 연구가) |
떡갈비는 원래 갈비뼈에 붙은 갈빗살에 칼집을 낸 후 작게 자른 안창살과 갈빗살을 뭉쳐 만드는데, 담양의 떡갈비는 갈비뼈에 다시 뭉쳐서 구워낸다고 한다. 거기에 불맛까지 더해져 손으로 들고 뜯거나 가위로 잘라야 하는 불 갈비와는 또 다른 맛과 편리함을 선사한다.
한우 고기는 뼈에 붙은 살이 훨씬 맛있다고 하는데, 떡갈비는 그 갈비에 붙은 살만 떼어서 빚었으니 더할 나위 없는 맛으로 감칠 맛 나는 양념장이 더해진 떡갈비는 입에서 녹는 부드러움과 육질이 풍부해 쫀득쫀득한 고기 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떡갈비는 고문헌이나 고 조리서에 등장하지 않는 전라도 지역의 담양이나 광주 송정리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구이 음식이라 할 수 있다.
떡갈비라는 이름은 만드는 방법이 떡 치듯이 다져서 만들었다 하여 떡갈비라 부르기도 하고 떡 모양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또는 인절미처럼 네모지게 만들었다 해서 '떡'이 붙고, 갈빗살을 사용해 '갈비'가 합쳐져서 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
| 담양 신식당 떡갈비. (사진= 김영복 연구가) |
담양식 떡갈비는 소갈비살에 손수 칼집을 내는 것이 원형이다. 뼈를 다시 붙여놓는 경우도 있다.
담양식 떡갈비는 두꺼운 정육면체로 부치며, 소고기의 쫀득한 맛과 식감을 살리는 것이 특징이다.
담양 떡갈비는 1인분을 떡갈비 조각 2~3개를 기준으로 하는데, 뼛조각이 포함되어 나오는 곳은 3조각, 뼛조각을 없애고 고기 중량을 늘린 곳은 2조각으로 제공되고 있다. 대나무로 만든 대통밥과 함께 담양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알려졌다.
어쩌면 담양식 떡갈비는『시의전서(是議全書)』 [음식방문]에 나오는 '가리구이'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음식이다.
1890년대에 쓰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시의전서(是議全書)』 [음식방문]에 '가리구이'라는 음식 이름이 보이는데, "가리를 두치 삼사푼 길이씩 잘라서 정히 빨아 가로결로 매우 잘게 안팎을 어히고(자르고) 세로도 어히고 가운데를 타(갈라) 좌우로 젖히고 가진(갖은) 양념하여 새우젓국에 함담(간) 맞추어 주물러 재여 구어라"고 했다.
그리고 광주 송정리식 떡갈비는 우리의 전통음식 섭산적과 비슷하다.
섭산적은 다진 쇠고기와 으깬 두부를 섞어 간장, 설탕, 소금, 다진 파·마늘, 참기름, 깨소금, 후춧가루로 양념하여 네모진 반대기를 만들어 석쇠에 구운 후 한 입 크기로 썰어 잣가루를 뿌린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쇠고기적갈이라고도 한다.
광주 송정리식 떡갈비는 1950년대 송정5일장의 '최처자'라는 분이 친정어머니와 함께 밥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치아가 좋지 않은 시댁 어른들을 위해 고기를 다진 뒤 양념을 해 떡갈비를 내놨다고 한다. 떡 갈비 맛이 좋아 시댁 어른들의 극찬을 받아 식당에서 메뉴로 내놨는데, 손님들 사이에서 매우 맛있다는 평과 함께 인기가 많아 이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다. 이후 최처자 씨는 1975년에 송정5일장에서 지금의 송정떡갈비골목으로 자리를 옮긴 뒤 영업을 계속했으나, 나이가 먹고 식당 일이 고되다는 이유로 1990년대에 영업을 그만뒀다고 한다.
송정시장에 우시장과 인근에 도축장이 있어 고기를 구하기가 쉬웠다고 한다.
송정리 떡갈비를 만드는 법은 살을 발라낸 갈비뼈에 밀가루를 조금 바른 뒤 다져서 양념한 갈빗살을 갈비뼈에 도톰하게 붙인다. 양념장은 간장, 배즙, 양파 다진 것, 청주, 설탕, 참기름 등을 넣고 끓인 후 고운체에 걸러 만든다. 뜨겁게 달군 석쇠에 떡갈비를 올려 애벌구이를 한 다음 기름솔로 양념장을 앞뒤로 발라 가며 타지 않게 굽는다.
현재 송정떡갈비골목에 있는 여러 떡갈비 집은 당시 고 최처자 할머니 식당에서 일한 직원들이 차린 집임을 표방하고 있다.
송정리식 떡갈비는 얇고 넓게 부친 형태와 돼지고기가 섞임으로 발생하는 부드러운 풍미를 살린다
이렇듯 광주광역시 근처 송정 지역에는 얇고 넓게 부친 형태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반반씩 섞어 만든 떡갈비는 부드러운 풍미가 있어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 떡갈비 골목이 조성되어 있다.
김영복 식생활연구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