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정용 한남대 교수 |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기존의 창업지원 체계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인다는 점이다. 기술 혁신도가 높지 않아 기술 스타트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렇다고 일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도 잘 맞지 않는다. 투자 유치 가능성도 낮아 액셀러레이터들의 관심 대상에서도 멀어진다.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어쩌면 지역 창업생태계의 실질적 주인공들이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무엇보다 지역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경력 단절이나 이주민 여성들이 기존과는 다르게 취업뿐 아니라 창업에도 도전할 기회가 열린다. 또한 앞으로 점점 고학력, 고경력 은퇴 시니어 계층이 두터워 지면서 이들에게도 창업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
만약 지역 농산물과 전통 공예를 결합한 체험 키트를 개발해 온라인으로 전국에 판매하면서 동시에 지역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러한 기업은 기술창업자보다는 지역 창업가이면서 일반 시민 창업가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모델은 이른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1000억 매출의 기업 하나만큼, 10억 매출 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것도 새로운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어떠한 가능성이 열려있는지 확언할 수 없다.
이러한 '제3의 스타트업'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첫째, 평가 기준의 다양화를 통한 발굴과 육성, 지원이다. 매출 성장률이나 기술 혁신도 보다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 자원의 활용도,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지원 방식의 유연화다. 대규모 자금 지원보다는 네트워킹 기회 제공, 멘토링 연결, 협업 공간 제공 등이 이들에게는 더 유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성공 모델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유니콘 기업이나 대규모 투자 유치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가치를 높이는 기업들을 성공 모델로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결자' 역할의 중요성이다. 지역 대학, 지자체, 시민단체들이 이런 기업들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 창업지원 정책이 보다 포용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되고, 창업가들이 주도적으로 창업커뮤니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지역은 기술 혁신만큼이나 중요한 '지역 혁신'의 새로운 시민 창업가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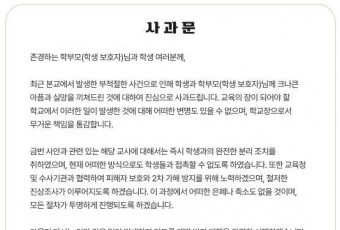




![[유통소식] 대전 백화점·아울엣, 추석·가을맞이 마케팅 활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9m/04d/78_2025090401000511800019511.jpg)


![[S석 한컷]리그3위 대전 팬들에게 하위스플릿을 이야기 했더니..](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9m/03d/85_20250903001631492_1.jpg)
![[S석 한컷]리그3위 대전 팬들에게 하위스플릿을 이야기 했더니..](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9m/04d/20250903001631492_1.jpg)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덕구청 남자 세팍타크로팀, `국내 세팍타크로의 새로운 중심으로`](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9m/04d/2025090301000295000010211.jpg)
![[박현경골프아카데미-시즌3] 방송은 프로, 골프장은 아마추어… 박희정 아나운서의 반전 레슨기](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9m/04d/20250902001704156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