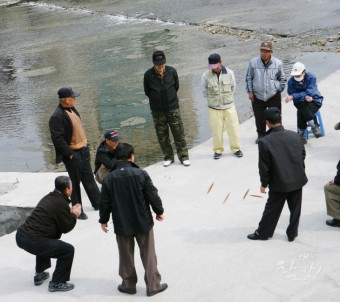|
| 장기태 소장. |
먼저, 오랜 기간 우리 산업의 중추였던 제조업이 구조적 한계를 직면하고 있다. 인구 변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는 우리나라 내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신흥 제조업 강국들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의사결정 자동화나 생산공정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AI를 도입하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단순한 기술의 채택을 넘어, 흔들리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AI는 기존 산업의 혁신을 넘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힘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로봇, 자율주행, 의료 영상 분석 등은 AI 도입을 통해 등장한 신기술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과 벤처가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작은 규모로 출발하더라도 빠른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대를 통해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지역 내에 AI 기반 신산업이 늘어나고 주력산업과 결합한다면,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산업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산업의 AI 전환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단지를 포함한 산업 클러스터의 고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규모언어모델(LLM) 같은 첨단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형 데이터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만, 지역 기업이 이를 독자적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전통 산업 중심의 기존 기업이나 신규 창업기업이 이러한 대규모 AI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활용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또한 기업 인력이 AI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을 심도있게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은 해당 분야의 도메인 전문성은 보유하고 있지만, AI 기술 자체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러스터 차원에서 적정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력산업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인프라 제공을 넘어 기업의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AI 전환 기술까지 지원하는 통합적 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인재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재 육성과 축적된 기술력으로 성장해온 나라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단순한 전문 인력 양성으로는 부족하다. 새롭게 요구되는 AI 전환은 기존의 인력 양성 방식을 넘어, AI와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융합 교육을 필요로 한다. 특히 지역 산업과 연계된 AI 인재를 길러내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해 산업 전환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인력 기반이 마련돼야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전환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AI 기술 패권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우리 산업의 AI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전통 산업을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과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 인재의 안정적 공급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역산업의 AI 전환은 결국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할 이유다./장기태 KAIST 모빌리티 연구소 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심효준 기자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