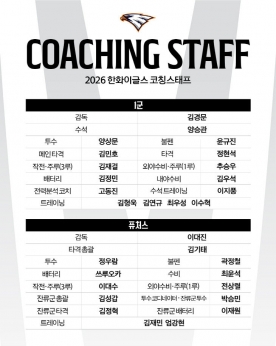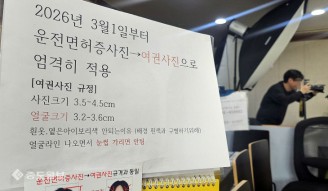심지어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하위 20% 격차는 12배 이상으로 나타난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한 채 값으로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를 100채 넘게 살 수 있을 정도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확대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먼 나라 얘기 같다. 이러한 차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확대나 인구 집중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린 현실조차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이 뒷전인 것 아닌가.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하남 등지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때는 수요·공급의 원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비수도권도 봐야 한다. 지방을 살리는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놓는 것이 맞다. 충청권 등 지방 입장에서는 수도권 공급 확대 계획도 부동산 양극화의 새로운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 지방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더 완화하거나 심한 경우, 적용을 배제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일관된 금융 지원과 합리적 세제 등 지방 부양책이 간절한 상태다.
장기간의 집값 정체로 미분양 주택이 쌓여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확실한 세제 혜택을 포함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사 부실 위험도 높아졌다. 주택 시장의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 지역만을 위한 금융·세제·규제 설계를 담은 종합 패키지 정책이 매우 아쉽다. 수요 진작과 유동성 공급에 목마른 지방 중심의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보고 싶다. 필요한 것은 '맛보기' 정책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처방전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