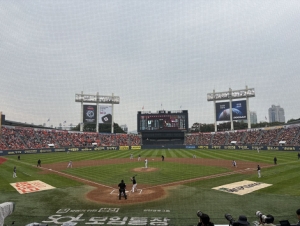|
| 김태열 수필가 |
큰아들이 싱가포르에 갔다가 무슨 뜻이냐고 한자로 된 액자사진을 카톡으로 보냈다. 한문은 독학이라 어림잡아 아는 수준이고 더구나 초서체로 쓴 글이라 통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KAIST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디지털 기기에 능숙하며, 퇴직 후 스스로 좋아서 자기만의 '한자 사전'을 만들고 있는 지인한테 부탁했다. 쳇Gpt와 크롬의 '이미지 텍스트 변환기'로 단서를 찾은 후, 구글에서 검색해 풀어냈다.
이 일을 겪어보니 학교를 졸업한 자의 평생학습에서 AI 출현으로 배움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진작 일의 의미도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바뀌었다. 앞으로는 평생지업(平生之業)으로 가야 하고 그 방법은 평생학습이다. 의문이 생겨 AI에게 질문하면 즉석에서 답해준다. 검색, 해석, 번역, 바이브 코딩, 그림, 글도 써주니 신통방통하다. '프롬프트'의 질을 높이고 질문 단계를 유도해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 프롬프트에 참조해야 하는 주변 정보와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도 등장했다. 이처럼 AI의 발전에 따라 '듀얼 브레인'에서는 코치 AI, 교사 AI와 같이 개인 맞춤형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지능형 에이전트 AI도 개발되고 있는데. 'Genspark' AI는 여러 범용 AI를 연결해 더욱 풍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AI 시대가 활짝 열렸다.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아서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핵심역량이다. 미술, 운동처럼 몸을 통해 습득하는 배움이 아니라면 제도권에서 배우는 데 시간과 돈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나이 듦에 배움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지금은 유튜브를 비롯한 오픈 방,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MOCC), 무료 AI가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세상이다.
80년대 후반 PC가 처음 보급되었다.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컴퓨터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계산 과정은 알지 못하고 나온 결과만 맹신했다. 하지만 오류를 줄 때가 있었다. AI 시대에는 AI가 어떤 자료로 학습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도 간혹 엉뚱한 답을 내놓고도 태연한데 이를 'AI 환각'이라 부른다. 확률추론에 기반을 두고 있어 어쩔 수 없다. 그렇기에 AI 시대에는 여러 종류 AI의 결과물을 비교하면서 내놓는 결과가 거짓인지 참인지, 더 나아가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지식의 획득이나 확충에 머물지 말고 거듭되는 질문을 통해 연결하고 융합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AI는 시니어들에겐 축복이라는 말도 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 질문하고 유효성을 고찰하는 능력과 판단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어서 그럴 것이다.
백세 시대도 버거운데 대전환기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화해도 누구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만의 시선으로 삶을 충실히 해가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내면에 숨어 있는 '어른아이'의 배고픈 씨앗을 찾아 싹틔우고 꽃피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지적 호기심과 디지털 도구 사용 능력이다. 모르면 더 무지렁이가 되고 알면 행운아가 되는 AI 시대에 '무엇이 될까,' '무엇을 이룰까'가 아닌 '무엇을 할까'는 당면한 생존의 화두다.
은퇴 후 남은 긴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해결책은 AI를 가까이 두고 활용하여 호기심을 키우고 지식을 연결해 사유의 공간을 넓혀가는 노력이다. 아무리 물어도 짜증 내지 않고 누구 못지않게 즉각 답을 해주는 동반자이자 선생님인 AI 덕분에 평생학습의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김태열 수필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2025 국감] 청년몰 사업 폐업률 절반가량... 소진공 국감서 뭇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0m/23d/78_2025102301001548300067501.jpg)
![[유통소식] 대전 백화점과 아울렛서 가을과 겨울 만끽해볼까](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0m/23d/78_20251023010015501000676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