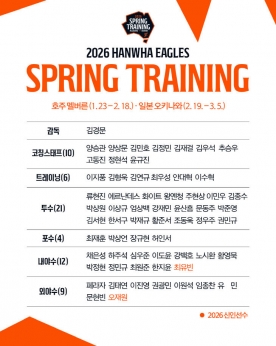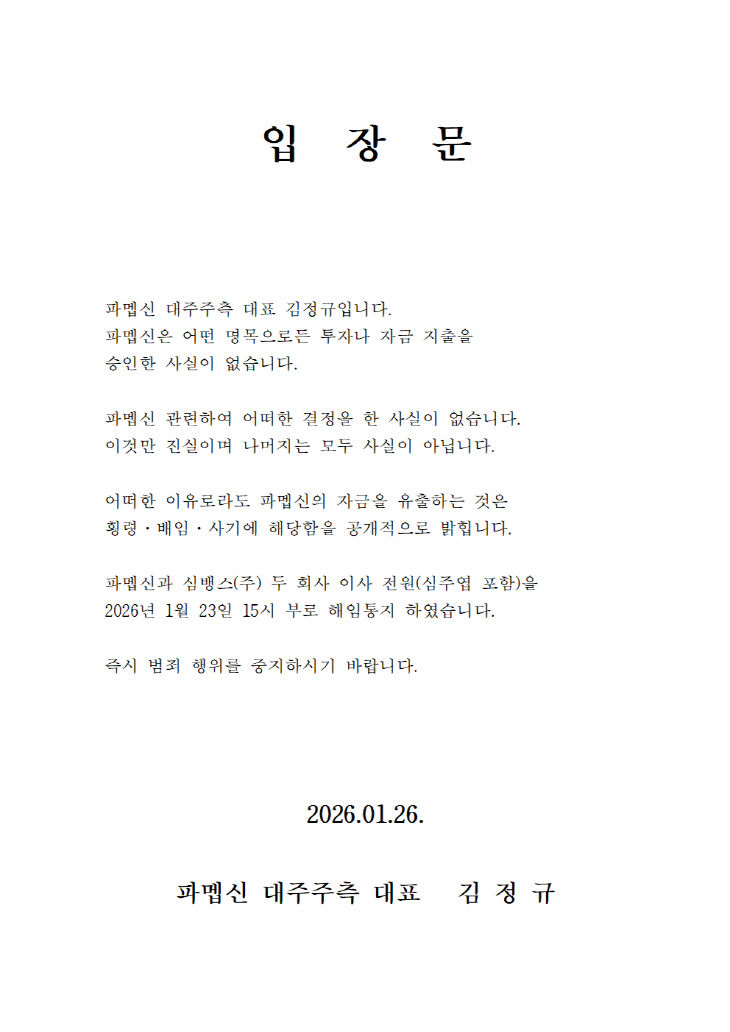10월 29일이 바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 평가하자면 제도 변천, 현장 정책 등 각 부문에서 성과를 이뤘다. 출발 당시 13.4%였던 지방사무 비율이 36.7%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방의회법은 국정과제로 겨우 확정되면서 입법 추진 동력이 확보됐을 뿐이다. 제헌헌법 제정 이듬해의 지방자치법 제정과 비교할 때 너무 늦다.
이처럼 집행기관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다 보니 지방의회는 소극적인 위상과 권한만 지닌다. 실질적인 인사권도 집행부 몫이다. 뒤늦게 광역의회 의장에 사무직원 임명권이 부분적으로 부여됐으나 기초의회는 의장 추천을 받아 단체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독립성과 권력 분립 측면에서 대등한 관계가 아직 아니다. 의회의 재정적 자율성도 약하다. 조례 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에서'로 못 박아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이 가로막히기도 한다.
재정은 특히 큰 문제다. 30년간 지방세 비중은 미세하게 증가(21.2%→24.6%)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2024년 46%(올해 평균은 43%)로 떨어졌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하면 세종시만이 50%를 넘긴다.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도입은 진일보한 것이다. 다만 주민 대표성이 강화되고 정책 결정 참여 기회만 늘었지 주민 체감도가 낮은 점은 해결 과제다. 자치행정권, 재정권, 조직권, 입법권 등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 '무늬만 지방자치' 탈피는 중앙부처가 기득권 유지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전고·한밭중 야구부 김의수·김종국 감독, `미래 야구 유망주들을 위해 최선을`](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1m/28d/20260129010022542000922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