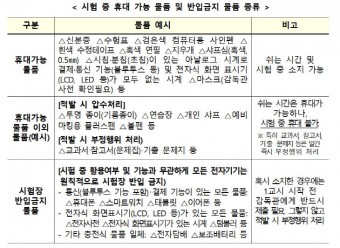|
| 박상옥 기획조정관 |
저출생과 지역소멸은 통계표의 숫자가 아니라 도시의 일상에서 먼저 드러난다. 늦은 저녁 불이 일찍 꺼지는 골목, 빈 교실과 사라진 동네 놀이터가 그 증거다. 개인의 결단만을 탓해서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선택은 결국 도시가 내리는 결정에 좌우된다. 집과 돌봄, 학교와 일터의 거리, 퇴근 이후 남는 시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그 결정을 만든다.
행복도시는 국가가 직접 설계한, 세계적으로도 드문 도시다. 처음부터 생활권을 단위로 삼아 집과 어린이집, 학교, 공원, 도서관을 걷는 동선 안에 배치했다. 대중교통을 등뼈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 구조를 핏줄로 삼았다. 도시가 시간을 아껴 주면 양육의 하루는 덜 버겁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돈으로만 보지 않고, 시간과 거리, 마음의 여유까지 포함해 낮추려는 시도다.
도시는 관계를 만든다. 육아는 가족 안의 일이면서 동시에 이웃과 직장, 거리에서 함께 만들어지는 공공의 경험이다. 집 앞 놀이터의 어른들 시선이 가장 큰 안전망이 되고, 골목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아이의 자율성은 자란다. 멀리 있는 대형 시설보다 가까운 생활 시설이 중요한 이유다. 행복도시가 지향하는 '가까운 도시'는 아이와 부모, 이웃을 다시 한 공동체로 엮어낸다.
도시는 구성원의 생각과 문화도 설계한다. 가까움은 공공성이다. 집과 직장, 보육과 쉼터가 이어진 동선이 갖춰질 때, 그리고 안전한 통학길이 있을 때 부모는 '연결의 피로'에서 자유로워진다. 아이의 권리가 도시의 표준이 되면 스쿨존과 보행, 놀이 공간은 교통 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일상의 기본이 된다. 아이가 우선인 도시에서 어른도 편해진다. 가까움과 넉넉함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만나겠다는 선택은 더욱 당당해진다.
세계의 수도와 대도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북유럽은 부모가 함께 쓰는 돌봄 제도를 정착시켜 '돌봄의 평등'을 일상으로 만들었고, 프랑스는 유아기부터 공적 배움을 촘촘히 연결해 양육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싱가포르는 주거와 재정 지원을 패키지로 엮어 첫 몇 해를 집중 지원한다. 교훈은 분명하다. 국가와 도시가 함께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면 출산은 사적인 결단을 넘어 사회적 선택이 된다. 행복도시는 이 보편적 해법을 공간과 서비스의 언어로 구현하고자 한다.
행복도시는 시작부터 공동체와 마을, 집 근처 가까운 쉼터 중심으로 그려졌다. 그 결과, '살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을 돌봄과 배움, 쉼과 놀이가 가까이 만나는 도시로 완성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정부가 새롭게 맡아야 할 중요한 책무다.
저출생과 지역소멸을 멈추는 해법은 거창하지 않다. 아이가 안전하게 걷고, 부모가 덜 지치고, 이웃이 서로를 믿는 곳. 도시가 그 기본을 지키면 인구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로 돌아온다. 행복도시는 우리 사회에 던져진 큰 고민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실험실이자, 다른 도시와 나눌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이다.
지난해 행복도시를 다녀간 한 일본 기자의 말이 귀에 맴돈다. "처음 와본 도시인데 어릴 적 살던 고향이 떠오릅니다." 오래된 격언처럼,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 마을이 곧 도시라면, 행복도시는 온 나라가 함께 키우는 아이의 첫 동네가 될 수 있다. /박상옥 행복청 기획조정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심효준 기자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