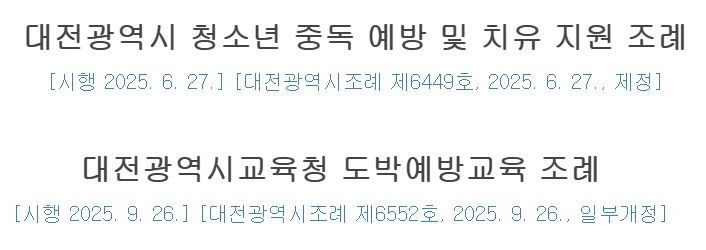|
| 김용성 충남대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서울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재학생의 97%가 학업 중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과제 작성과 발표 자료 준비 등 학습 전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필자도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AI 사용을 권장하지만, 권장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는 20대의 생성형 AI 사용 경험은 75.4%인 반면, 40대는 61.7%, 50대는 45.8%에 그쳤다. 연령대별 사용 비율만 보아도 대학에서 학생들의 AI 활용 능력이 교수보다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과 3년 사이 우리 생활은 AI로 인해 급격하게 변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웹에서 AI가 생성한 콘텐츠(53.5%)가 인간이 생성한 콘텐츠(46.5%)를 넘어섰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가 보는 수많은 콘텐츠들은 AI 손에서 만들어졌을 확률이 높아졌다. 사람은 한번 편한 것을 경험하면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으로 생각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평가 방식의 전면적 개선이다.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가 AI가 작성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AI 분야 선두주자 오픈AI는 99% 정확도의 AI 탐지기를 개발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0.01%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만약 한 학생이 AI로 리포트를 쓰지 않았는데, AI 탐지기 실행 결과 90% 문장이 AI로 썼다고 F 학점을 받으면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교수자들이 '챗GPT로 썼는지'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는 대신, 애초에 AI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기 전 챗GPT에 관련 주제를 입력해보면 답이 잘 나오는 과제인지도 사전에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 평가는 'AI 기반 오픈북'이라고 전제해야 한다. 학점이 취업과 직결되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좋은 학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험에서도 AI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더욱이 요즘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공정성이다. 누군가는 AI로 답을 찾고 누군가는 실력으로만 평가받는다면, 학생들은 그 평가 방식 자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지역 대학들도 분명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여러 대학에서 바쁘게 움직였던 기억이 난다. 물론 그러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양심적으로 AI를 쓰지 말라', 'AI를 쓰면 불이익을 준다'며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평가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기다. 미래 평가는 '결과물'보다 '과정'에, '지식'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학생들이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며,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는지의 과정이 오히려 중요해지는 시기다.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관찰하고, 사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게 하는 평가가 더욱 가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학은 교수들의 다양한 강의 상황(대형 강의 등)을 고려해 평가 등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LMS 시스템을 개편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지와 처벌이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 평가 체계다. /김용성 충남대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독자제보] "폐업 이후가 더 지옥" 위약금에 무너진 자영업자](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10d/55.jpeg)






![[독자제보] "가게 닫고 나니 진짜 지옥" 비대면 자동주문 시스템 위약금에 무너진 자영업자](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10d/78_20260209010007915000329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