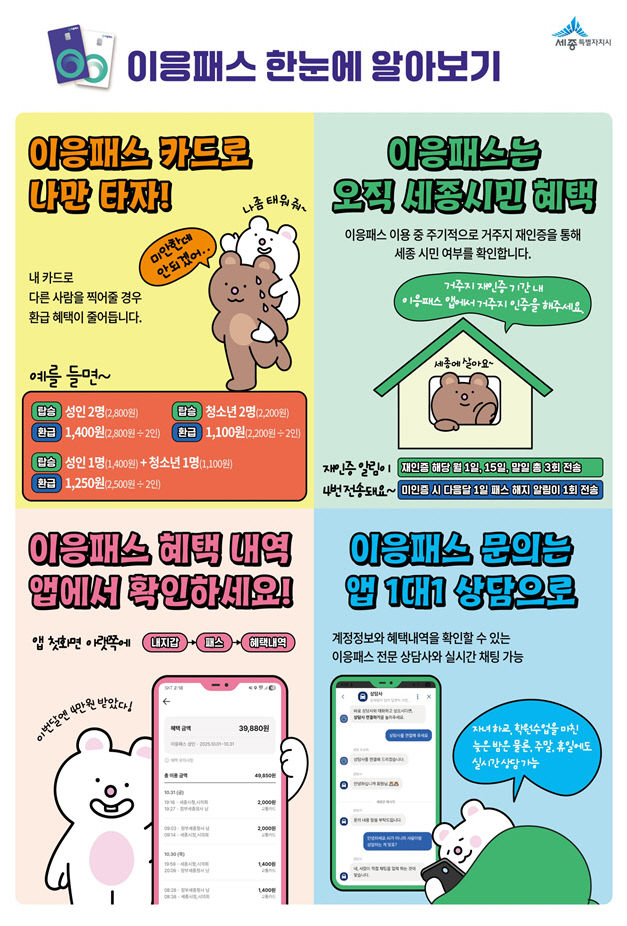|
| 이강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광도측정그룹 책임연구원 |
장치를 보신 많은 손님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흑체를 직접 보니 신기하다고 말씀한다. 필자도 KRISS에 임용돼 처음 흑체를 보고 같은 이유로 신기함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흑체가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흑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빛의 색깔별 세기(분광 복사휘도, spectral radiance)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양자역학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흑체는 모든 색깔의 빛을 완벽히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로, 영어로는 'black body'라고 불린다. 19세기 물리학자들은 흑체의 분광 복사휘도가 그 모양과 크기와는 상관없이 오직 흑체의 온도만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실험 기술의 발전 덕분에 온도에 따른 흑체의 분광 복사휘도 값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시의 고전 물리학 이론으로는 측정된 흑체의 분광 복사휘도 값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흑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가 오직 플랑크 상수와 빛 주파수의 곱으로 결정되는 불연속적인 값이어야 한다는 양자가설(Quantum hypotheses)을 제안한다. 이 가설을 통해 실험으로 측정한 값과 매우 잘 일치하는 플랑크의 복사 법칙(Planck's radiation law)을 도출하게 된다.
플랑크는 그의 노벨상 강연에서 양자가설을 찾아내던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그 고된 노력의 결실인 양자가설은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과 보어의 원자 모델 등 다른 물리학자들이 세우는 양자역학 초기 이론의 바탕이 된다. 최근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 기술도 따지고 보면 이 양자가설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파생된 양자역학의 엄청난 성과들을 제외하더라도, 플랑크의 복사 법칙은 그 자체로 현대 과학기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이 법칙에 따라 우리는 온도계를 직접 가져다 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물체가 방출하는 빛의 색깔별 세기를 분석해 그 물체의 온도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주 먼 우주에 있는 별의 온도를 알 수 있게 됐으며, 제철소 용광로 쇳물의 온도도 알 수 있게 됐다. 팬데믹 시절 많이 활용했던 비접촉식 체온계도 플랑크의 복사 법칙에 근거해 만들어진다.
또한, 플랑크의 복사 법칙은 광도 측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준광원을 제공해 준다. 플랑크의 복사 법칙에 따라 흑체의 온도를 알면 그 흑체의 분광 복사휘도를 바로 알 수 있고 파생되는 분광 복사조도(spectral irradiance)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해 KRISS와 같은 국가 측정 표준 기관은 최대한 이상적인 흑체 광원을 만들고, 이를 램프나 LED 등 다른 광원과 비교해 각 나라 광원 산업에 표준을 보급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KRISS의 흑체 복사 표준광원 장치가 이를 위한 장치다.
아이러니하게도 플랑크가 물리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던 시절 그의 지도 교수는 물리학이 더 이상 크게 발전할 여지가 없으니 다른 분야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한다. 당시의 회의적인 전망과는 달리, 양자역학이 탄생해 물리학 분야의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극적인 전망보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도전과 고된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다.
흑체 복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한 문단 더 적고자 한다. 중도일보에서 지면을 마련해 주시고 KRISS 홍보실에서 추천해 주신 덕분에 부족한 점이 많은 필자가 올해 여섯 번 '사이언스 칼럼'에 기고할 수 있었다. 중도일보와 KRISS 홍보실 그리고 무엇보다 칼럼을 읽어주신 독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강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광도측정그룹 책임연구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美 베네수엘라 공습]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1m/05d/78_20260105010003056000119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