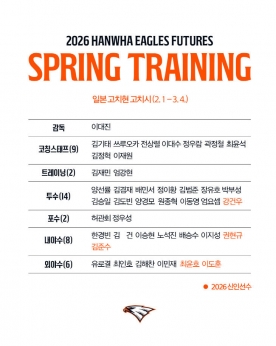|
| 김충일 북-칼럼니스트 |
하지만 계절의 바퀴는 멈출 수 없는 법. 오늘은 '벌써'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24절후 중 언 땅과 강물이 녹고 풀리고 봄으로 들어서기를 시작한다는 입춘(立春)이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새순이 돋는 날'이다. 옛 사람들이 입춘의 '입'을 '들 입(入)'이 아닌 '설립(立)'으로 쓴 것을 보면, 계절의 변화가 주는 문자 상상력은 삶의 진실을 예단하고, 삶의 의미를 깨우쳐주면서, 삶의 진실을 게시하는 신선한 '시간 감각적 사유의 풍경'을 그려내는 힘이 되었는가 보다.
입춘은 얼어붙은 겨울의 대지 위로 새싹이 돋아나듯, 생명의 기운이 스스로 알아서 '일어서는' 자연의 리듬이며, 찬 기운이 가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선언이다. 비록 피부에 닿는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눈앞의 풍경은 삭막할지라도, 땅 밑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서고 있다는 자연이 속삭이는 희망의 예고편이자 자연이 그리는 생명화(生命畵)이다. 하여 입춘은 겨울의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첫걸음이 되어, 내 일상에도 봄이 찾아왔다는 깨달음을 베풀어준다.
게다가, '봄으로의 문'을 세운다는 입춘의 표토를 걷어낸 삶의 속살에선 "여물위춘(與物爲春):타자와 함께 봄(春)이 되어야 한다."이란 장자의 이야기가 단단한 울림 되어 다가온다. 온화한 생성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안겨주는 자연 속의 봄과 달리 인간이 살아내야 할 삶의 봄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되어야 한다(바람직한 삶)"라는 적극적인 신념과 결단을 간직하고 "만들어야 한다(바라는 삶)"라는 태도를 지속해야 한다. 입춘은 얼음 동굴에 갇힌 '너(타자)'와 '나'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며 일구어 내야할 삶의 봄이다. 중요한 건 그것을 만드는 주체가 '나'라는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나는 타자와 함께 터널을 빠져 나와 봄의 세상을 만들며 살 수 있을까?
'타자와 함께 봄의 세상 만들기'를 위해 장자의 위시(爲是)와 인시(因是) 이야기를 소환해 본다. 위시는 '이것이라 생각 한다(知)'라는 뜻이고, 인시는 '이것에 따른다(行)'라는 뜻이다. 그 철 그날에 맞는 마음을 살펴 겉을 뒤집고 속마저 뒤집어 내가 끌리는 '너(타자)'에 대하여 앎(지)과 삶(행)의 역설적 일치로 살아내라는 명령이다. 나를 비워 행으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의 행동을 나의 주관으로 시시비비하지 말고 맞추어가는 감각적 사유의 넓은 폭과 깊은 속을 요구한다.
'너(타자)'를 대할 때, 지행합일(知行合一)의 태도를 일상에 깆들도록 주문한다. '일상'이란 '사용(用)'을, '사용'이란 '소통'을, 그리고 '소통'이란 바로 '얻음(得)'을 말한다. 이런 얻음에 이르면 세움(立)에 다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일상의 매서운 날씨 속에 저리 고운 매화꽃을 세우듯(겨울 속의 봄), 침묵과 역설의 세상사 속에서 '너'가 '나'가 되고, '타자(너)'가 '나'가 된다,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 판단을 내려놓고(立) 소통(春)이 될 때,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되어 손잡고 걸을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말이다.
오늘은 아직도 마음을 풀지 못해 새초롬해진 인고의 잠금 통을 풀기 위해 예쁜 소망이란 키를 작동시키는 첫날이다. 나목에 걸린 방패연처럼 늘어진 햇살이 반짝이며 어룽거린다. 한 낮엔 훈풍과 우수를 만날 기약의 씨앗들을 바스락거리는 대지를 흔들어 심어보자. 그리곤 이른 저녁에 작은 식사를 마친 후, 몇 번이나 미루고 망설인 지인에게 꾹꾹 눌러 쓴 '입춘의 안부'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고 볼일이다. /김충일 북-칼럼니스트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