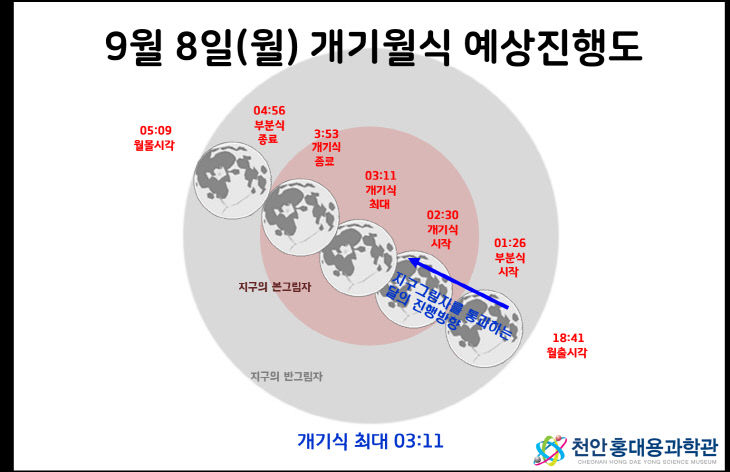|
| 김태열 수필가 |
한자에 '즐겁다'라는 뜻을 가진 대표적인 단어로 열(悅)과 락(樂)이 있다. '열'은 내부에서 차오르는 희열을 뜻하는 데 반해 '락'은 바깥으로부터 충족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오늘날은 쾌락(快樂)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도파민 충족사회라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는다. '열과 락'이 함께 들어 있는 가장 오래된 구절은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었을 논어 첫 장에 나온다. 배우고 자주 익히면 어찌 기쁘지(悅) 않겠는가. 먼데 있는 벗이 찾아와 준다면 어찌 즐겁지(樂) 않겠는가.
유교 문화권에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학(學)이라는 글자를 참 좋아했다.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기도 하지만 험난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기만의 성 쌓기와 같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배움은 제한적이기에 현대인들은 책,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기만의 배움의 기쁨을 찾는다.
한 달에 한 번 가지는 문학 독서 모임이 있다. 일 년 동안 읽고 싶은 책 12권을 선정해서 매달 1권씩 감상문을 써서 나눈다. 지난여름에는 '이방인'과 '페스트', '시지프 신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알베르 카뮈의 '결혼·여름' 읽고 소감을 나누었다. 2시간여의 모임이 끝난 후 가슴속에 잔잔하게 차오르는 기쁨이 올라왔다. 돈이나 명예가 드리운 그림자를 바라지도 않고 스스로 좋아서 할 뿐인데도 나이 듦에 같은 곳을 바라보며 길을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즐겁다는 생각까지 끌고서 말이다.
'결혼·여름'은 부조리와 반항의 철학으로 유명한 카뮈의 에세이다. 그가 향후 전개할 부조리 철학의 맹아를 품은, 문학의 영롱한 원석 같았다. 20대 청춘에 쓴 '티파사에서의 결혼'에서는 '오직 햇살, 뜨거운 돌의 맛이 나는 삶, 바다의 숨결과 지금 울기 시작하는 매미들로 가득한 삶'을 읊조린다. 현재가 아닌 다른 시점에 시선을 가두는 삶은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므로 그런 인생은 불행하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과 알제리 독립전쟁에서 삶의 부조리를 깊이 자각한 후 쓴 '티파사에 돌아오다'에서는 '여름의 도시로 남아있는 티파사가 갑자기 겨울의 도시로 변해 웃음이 사라졌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겨울 한 가운데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름이 있다'라며 희망을 품는다.
글쓰기는 깊이 있는 독서를 거쳐야 한다. 대가들의 책을 읽으면 그냥 대가가 아니다. 그들은 젊을 때부터 치열한 독서를 통해 사유를 다듬고 다듬어 자기만의 문체로서 독자에게 영감을 주기에 불멸의 작가로 남은 것 같다. 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선 왜소한 학생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들과 벗하고 싶다.
우리는 선정된 책을 꼼꼼히 되풀이 읽고 융합하여 자기만의 글로 펼친다. 저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느끼는 곳이 다름에 흥미를 느낀다.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때론 공감하며 뛰어난 점을 발견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다. 우리는 마음속에 차오르는 희열을 우정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지 타인의 인정 같은 목적을 미래에 투영하지 않는다. 벗과 더불어 카뮈와 함께 지냈던 여름의 시간은 행복했다. 인공지능이 제아무리 책을 읽어 학습해도 우리의 이런 기쁨을 대신할 수는 없으리라.
인연 따라 스며들었다가 흘러가는 세상이다. 부조리한 삶에서 무엇을 기약하며 기대할 것인가. 그냥 할 수 있는 자기 몫만 하고 떠나면 그뿐이다. 세월이 흐른 후 어느 날 문득 벗들과 나누었던 기쁨의 순간을 떠올리며 행복과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으면 잘 놀다(遊)가는 삶은 아닐지. 김태열 수필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S석 한컷]리그3위 대전 팬들에게 하위스플릿을 이야기 했더니..](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9m/03d/85_20250903001631492_1.jpg)



![[S석 한컷]리그3위 대전 팬들에게 하위스플릿을 이야기 했더니..](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9m/09d/20250903001631492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