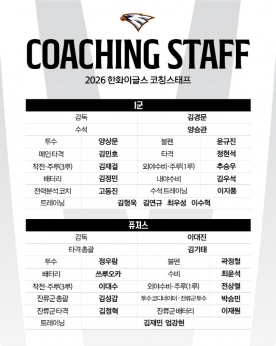|
|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
이에 대한 여러 이론이 제기되고 있지요. 조직에 대한 애착 등이 조직의 장기적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조직몰입이론'이 있는가 하면, 직원의 전문 역량이 생산성의 핵심적 자산이라는 '인적자본이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의 '필요'에 의해 이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선 안정성과 조직의 응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성심이 있는 직원을 우선하는 게 합리적이며, 성과와 혁신이 필요한 곳에서는 전문성이 강한 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인재의 등용은 기업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일단 논쟁의 원형은 중국 정치에서 찾을 수 있지요. 중국 현대사의 핵심적 갈등 중 하나는, 정치적 충성심과 계급적 '당성(red)'을 앞세운 세력과, 기술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전문가(expert)' 세력 사이의 경쟁이 문화혁명 전후에 중요한 맥락을 형성했습니다.
1950년대 초부터 마오쩌둥(毛澤東) 체제가 형성되기까지 당연히 정치가 우선이고 기술이나 전문성은 그다음이었지요. 정치적 충성심(red)을 가진 간부들이 우대받았고, 지식인이나 전문가 집단은 '부르주아 잔재'로 의심받았습니다. 대약진운동(1958~1961)을 거쳐 문화 혁명기(1966-1976)에는 당성(red)이 극단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지식인은 자산계급의 하수인'이라는 인식 아래 지식인, 과학자 집단인 전문가 계층을 비판하고 그들을 농촌으로 강제 전출하는 '하방(下放)'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시기 유명한 '홍위병'이 등장하였고 그들의 상징적 구호인 "붉은 것이냐, 전문적인 것이냐."가 제기되었으며 그 시기에는 전문가(expert) 집단은 거의 소멸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1976년 마오쩌둥 사후 문화혁명이 종결되면서 덩샤오핑(鄧小平)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유명한 '흑묘백묘론'(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이 등장하였고, 이것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곧 정치적 충성보다는 전문적 능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방향 전환을 의미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복권되었지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정치는 지금까지 정치적 충성과 전문적 능력을 결합하고 절충하는 체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채용(개인기업 제외)은 엄격한 시험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성심과 전문성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권한이 확대되는 승진이나, 보직 결정에서는 조직의 필요에 따라 충성심과 전문성을 선택할 수 있겠지요. 특히 정치권(黨)에서는 글자 그대로 당성(黨性)을 중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런 특성 때문에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의 '비합리적' 행태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 중국에서 문화혁명 당시에도 당성을 극도로 강조했지만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문가적 역량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사가 그렇듯이 충성심이나 전문성의 양자택일은 아니고 둘의 절충이 필요하고 어떤 조직이든 장기적으로는 충성심이나 전문성을 떠나 합리성과 공정성이 생명력을 갖는 것입니다.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현옥란 기자
현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