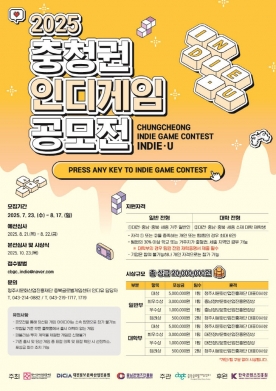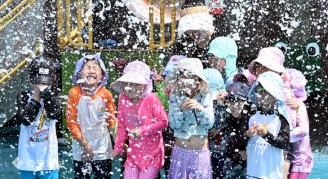천수만의 경우처럼 볏짚 존치를 위주로 하면 적은 예산으로 넓은 면적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남은 볏짚을 밑거름으로 활용한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이같이 곡식을 심게 해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방법만이 아니라 환경 농법 등 다양한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 철새 생활권이 하루 수십㎞인 점을 감안, 서산 부석면과 고북면, 홍성 서부면 갈산면 등과 인근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갈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천수만 일대가 철새들의 천국이 된 것은 이동경로인 물과 뭍이 만나는 해안에 위치하고 대규모 간척지 농지가 있어서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시작하는 11월부터는 추수 후 점차 먹이원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겨울철새 서식지로서 적합한 조건이 깨지기 마련이다. 생물다양성은 유전자, 생물종과 함께 생태계의 다양성이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 참여로 인한 피해를 해소해 주는 단순한 인센티브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철새보호 활동 참여 유도가 이 사업의 부수적인 효과가 돼야 한다. 물론 사업 추진 후 사후 관리도 잘해야 한다. 일부 다른 지역의 사례지만 계약을 체결하고도 벼를 몰래 수확하고 작물을 심다가 단속당한 곳도 있었다. 주민의 이기심과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천수만 철새들이 떠나는 일은 없길 바란다.
천수만과 함께 국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한강, 창원 주남지, 창녕 우포늪, 순천만, 해남 고천암호 등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먹잇감과 쉼터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위적인 사업을 통해 천수만 지역의 생태환경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 사업의 성패는 지역의 우수 생태자원 유지와 농한기 소득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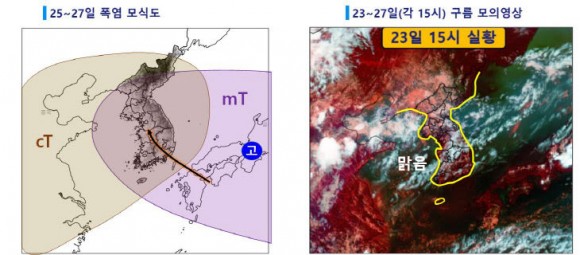









![[박현경골프아카데미]스크린 골프장 주인이 회원들과 내기 골프를 쳤다는데.. 결과는?](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7m/08d/85_20250708001746512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