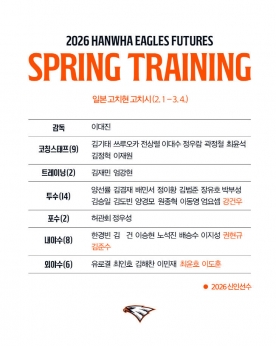|
| ▲ 고미선 편집부장 |
내가 처음 소녀를 만난 그 날은, 코끝까지 에이는 칼바람과 함께 함박눈이 회색 하늘을 뒤덮은 오후였죠. 도심 속 공원입구 차디찬 의자에 앉아있던 소녀의 맨발이 안쓰러워 손에 쥐고 있던 우산을 내밀어 보았어요.
올해 중학생이 된 우리 딸아이와 비슷한 또래일까…. 귀밑 단발머리와 뜯겨진 머리카락, 단호하게 꼭 말아 쥔 주먹이 슬퍼 보이네요.
소녀에게 유일한 친구는 어깨위에 앉아있는 작은 새 뿐인 듯 싶은데, 옆에 놓인 부재(不在)의 빈 의자는 그 누구를 위한 걸까요. 땅에 닿지 않는 발 뒤꿈치 만큼이나 불편하고 외로운 모습, 텅 빈 눈동자에 흐르는 미처 말하지 못한 진실과 염원들이 마음을 마구 헤집어 아파옵니다.
그 소녀가 처음 대전으로 온 날은 2015년 3월 15일, 둔산동 보라매 공원에서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군요.
어서 빨리 만나서 소녀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귀향
며칠동안 소리 없이 앓았다.
생각만 해도 숨이 가빠지고, 코끝부터 물기가 차올라 눈을 꼭 감아버리고 만다.
끔찍하고 불편할 것이라고 예감은 했었다. 꼭꼭 감추고만 싶었던 역사의 민낯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니까 말이다.
위안부 피해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귀향(鬼鄕)의 귀는 귀신(鬼神)의 귀다. 죽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가슴 아픈 제목의 의미를 뒤늦게 알았다.
7만5000명이 제작비를 보탰고, 조정래 감독이 14년간에 걸쳐 만든 영화란다.
일제강점기 시대 20만명의 소녀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단지 238명만이 돌아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는 줄어들고 사람들의 관심도 희미해 질 것이다. 20년 후엔 교과서에서만 위안부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두렵다.
혹자는 이런 영화를 100번 만든다고 무엇이 달라지냐고 묻는다. 글쎄…. 나라를 빼앗기고도 방 한구석에 앉아 거리의 만세운동가들을 어리석다고 비난할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을까.
국민들이 만든 영화, 엔딩 크레딧이 흐르고 있을 때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 순간 75,270명의 후원인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딸, 미안해
겨우 13살, 14살의 소녀들이랍니다.
꽃다운 아이들이 '근로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의 성노예로 끌려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더 지옥같은 현실은 세월이 지나 해방이 된 이후에도 우린 침묵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상 발표를 기억합니다. 그 협상의 중심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없었습니다.
몇십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을 겨우 10만엔(약 100억)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이제 한국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발언할 수 없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치운다는 조항까지 있다고 하니, 잊혀질 일만 남은 거군요.
그날의 13세 소녀가 89세의 할머니로 오버랩 되는 오늘, 딸을 둔 엄마는 무기력한 나라와 무관심한 어른들이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반성 없는 합의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힘 있는 정치인과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시대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유대인의 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미선 편집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고미선 편집부장
고미선 편집부장






![[단독] 세계적 애니메이션 거장 넬슨신 박물관 대전온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01d/78_20260201010000064000993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