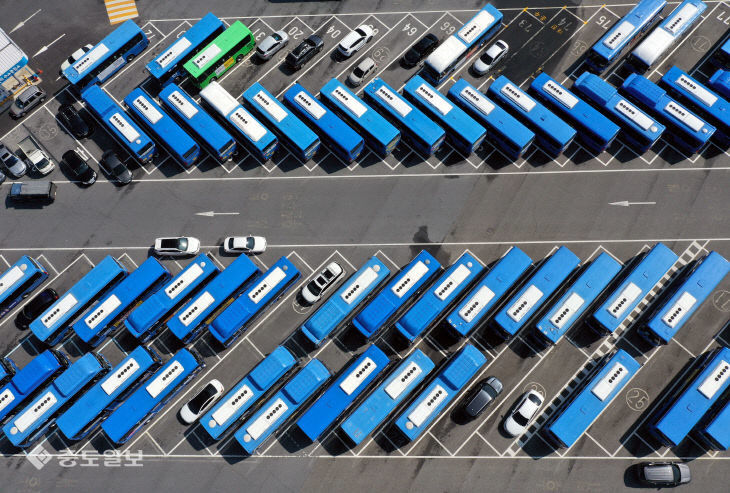 |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임. |
허술한 관리 속에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시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대전시는 음주운전 뿌리를 뽑겠다며 '운행 전 음주측정 의무화'를 도입했으나, 정작 현장에선 음주 상태인 기사들을 철저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21일 중도일보 취재에 따르면 10월 18일 낮 12시께 A시내버스 업체에 소속된 버스기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 해당 운전원은 오후 근무자로 운행 전 음주측정 과정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6%가 나왔다. 이 사실을 A업체 관리자들 역시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운행을 시켰다는 것이다.
대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은 회사나 관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묵인한 채 음주 측정된 기사를 현장에 내보내는 관례가 빈번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른 시내버스 B업체 소속 기사는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도 올해 중순쯤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며 "음주 상태가 명확하게 확인됐지만, 기사가 회사와 우호적인 관계이면 '쉬쉬'하며 근무지에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 13개 시내버스 업체는 매일 새벽과 오후 근무자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는 음주 측정이 의무화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음주자들의 버스 운행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분명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무책임한 버스 기사와 회사의 부정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대전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버스 운전원 김 모씨는 "버스 기사가 회사 몰래 음주 운전을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음주 결과가 곧바로 관리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회사도 분명 인지한다"라며 "이 같은 관행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런데 매년 달라지는 게 없어 시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감독망에서 벗어난 채 업체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음주 단속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음주 상태로 운행하는 기사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음주 기록지를 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확인하고 있다"라며 "음주 적발 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내리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려 한다"고 답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월화수목 달빛걷기] 꽃샘추위도 이슬비도 꺾은 갑천 함께걷기 열정…"대전 걷기문화 선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5m/11d/78_2025051101000616200027841.jpg)
![[2025 서천 안전 골든벨] 초등생 239명 안전 퀴즈왕 열전! 서천초 퀴즈왕 배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5m/11d/78_2025051201000643600028651.jpg)
![[박현경골프아카데미]리본, 스펀지, 방망이! 이것만 연습하면 스윙이 달라집니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5m/05d/85_20250505001526087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