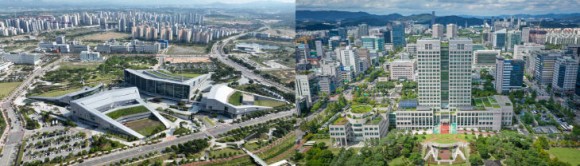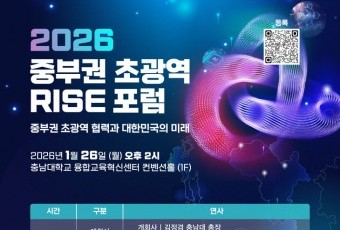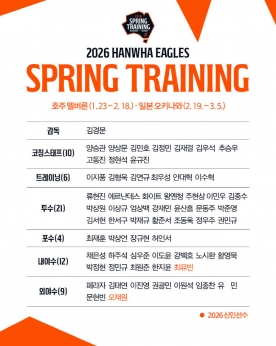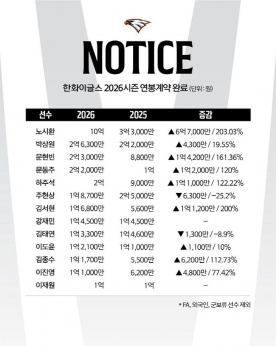|
| 권인호 스페이스해킹 대표,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운영위원 |
일견 동의하는 지점들이 있다. 정부와 정치 영역이 우리의 일상과 삶에 기반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역학관계와 승리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정치'나 '정당'이 아니라 '운영 방식'에 있다. 이른바 정당(政黨)이 정당(正當)하기 위한 '방식'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부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 선거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는 비판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 갖고 동참한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가치 시대정신 대한민국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대통령 후보 그 후보를 배출하고 확정 짓는 조직은 정당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캐스팅 보터라고 불리는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간단한 답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청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청년의 일상과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일상과 삶을 바꾸는 지점에 정당이 있다. 정당이 단순히 선거 때 후보를 내는 선거 정당이 아니라 풀뿌리 정당으로 유권자들의 삶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은 근본적이고도 혁명적인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정당(政黨)이 정당(正當)하기 위한 '방식'이다.
그렇다면 정당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의제별·세대별 조직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인식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일상들을 공통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언어는 의제별, 세대별로 바라보는 삶의 스펙트럼이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논쟁을 일으킨 주요 의제들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특정 세대나 이해관계 집단이 있었다. 예를 들어, 페미니즘 이슈는 2030 여성과 남성의 가치관 충돌로, 기후 이슈는 청년과 장년층의 미래 인식 차이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중 정당이 된 양당은 선거 때가 되면 두루뭉술하고 획일적인 공약을 내놓거나,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의제별·세대별 정당 커뮤니티'다. 예를 들어, '기후정의위원회', '디지털 인권 특별팀', '청년주거TF' 등 구체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한 소모임이 정당 내부에 활발히 활동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연구 모임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부터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이어야 한다.
독일 녹색당은 1980년대부터 환경·평화·성평등 등 의제별 네트워크를 강화해 정체성을 확립했다. 특히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래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우리도 의미 있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 의회'나 '여성 정책 연구회' 등의 시도가 그런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상징적 참여나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정치 참여의 주요 창구가 된 지금, 정당은 물리적 조직을 넘어 가상 공간에서도 의제별·세대별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내에서 청년들이 정책 토론에 참여하거나, 중장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당이 정당한 세계가 되려면 시민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제별·세대별 조직화는 단순한 정당 활동이 아니라, 정치의 본질을 '대표'에서 '소통과 교감'으로 전환하는 혁신이다. 새로운 정부와 민주주의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정치의 미래는 의제로 뭉치고 세대로 잇는 데 있다."?이제 정당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권인호 스페이스해킹 대표,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운영위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