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새 정부에서 빛을 보는 이 제도는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민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내세우는 이점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급격히 하락하는 쌀 가격도 방지할 수 있다. 이 법의 연원은 75년 전으로 소급될 만큼 뿌리가 깊다. 농안법도 취지를 잘 살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계획을 세우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설적이지만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쓸 일이 없게 만들수록 좋다.
국내에서 과잉 생산되는 곡물이 사실상 쌀밖에 없기에 쌀에만 적용된다면 이 법에 내재하는 한계일 것이다. 그간의 정부수매제, 목표가격제, 공익직불제 등의 연장선에서 현실에 새롭게 맞출 필요가 있다. 쌀 수급 균형 면적과 타 작물 목표 면적을 미리 계획해 작물 전환 노력을 특히 강화해야 한다. 농수산물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은 헌법적 책무(헌법 제123조 4항)다. 다만 공급만 늘리는 정책이 안 되도록 전체적으로 본격 시행될 때까지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쌀값 정상화법이란 미명 아래 단순히 쌀 의무매입법이 되면 안 된다.
부작용은 여전히 걱정이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과잉 생산 유발, 과도한 국가 재정 부담, 쌀 생산에 집중한 결과인 곡물 다양성 저해는 예상되는 문제다. 쌀 시장 왜곡이 없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정을 흔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농업경쟁력을 무너뜨린다는 '농망법(農亡法)' 프레임을 깨끗이 털고 지역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법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효율적인 수급 관리로 식량 안보와 농촌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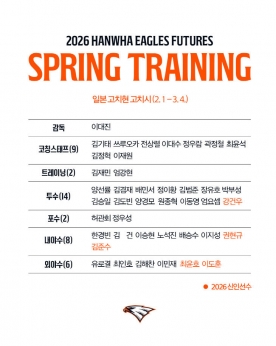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전고·한밭중 야구부 김의수·김종국 감독, `미래 야구 유망주들을 위해 최선을`](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1m/29d/20260129010022542000922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