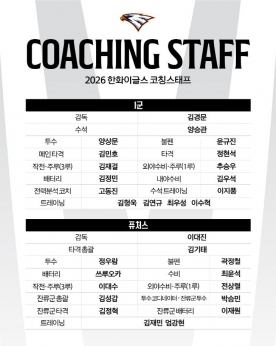|
| 김충일 북-칼럼니스트 |
지난여름에는 누구에게나 되풀이되는 돌림노래인 양 필자에게도 일상의 빈틈과 구멍을 메우는 장맛비가 무시로 내렸다. 평생 처음 겪는 '허리 압박골절'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하려고 아내는 이방(異邦)의 기분이 되어 병원을 찾아 비처럼 흘러 다녔다. 누구나 빗방울을 부수기 위해 나름의 우산을 찾는 일은 인지상정.
아내와 함께 빗물과 땀방울의 총량이 앞을 다투던 어느 날 우산을 잃어버린 듯한 심신을 이끌고 병원 진료실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진료를 마친 팔십 대 중반의 지팡이를 짚고 있는 할머니가 육십 대 초반의 한 의사와 헤어지며 나누는 목소리가 또렷하다. "의사 양반! 이렇게 잘 살펴주시는데 안 나아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미안합니다."
말라버린 대화와 물러터진 변명이 굴러다니는 세상에 환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안 나아서 미안하다니!' 미안하다는 단어의 뜻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남에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럽거나 겸손하게 양해를 구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닌가. 선생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고쳐 주시는데 이렇게 안 나아서 미안하다니. 제 몸뚱이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날의 이 일은 편안한 듯한 일상의 울타리를 돌연히 깨는 사건이 되어 나 자신의 내면적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실존적 독감'을 걸리게 했다. 실존적 독감이란 '살아감'의 여정이 담고 있는 어두운 그늘이지만, 누구나 이 독감에 걸리는 것은 아닐 게다. 자기 삶에 의미 물음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유적 질병'이라면 지나친 진단일까. 그 '미안'에 생각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접속해 본다.
'未安(미안)'의 '未(미)' 자는 아닐 미, 아직 편안하지 않다, 언제까지나 편안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 아직 편안하지 않다. 내 전 존재가 불편하다는 말이다. 우린 이 세상을 살며 자기의 삶과 남의 삶에 미안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미안함을 간직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 이때 아름답다는 건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딱 들이대는 것. 그래서 미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란 성찰의 피뢰침이 예방해준 '미안'이다.
침묵과 어둠에 갇혀 삶에 지친 발걸음을 옮기는 너·나에게 나의 부족함에도 너의 손 잡아주고, 너의 지침과 허전함에 나의 상처를 뒤로하고 함께 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마음의 빛이 밤하늘에 띄워 보내는 별이 '미 안'이 아닐까. 그래 '나·너 미안해'라는 말을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 더 미안한 일이 있을까. 오직 나·너만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 남는 나날들. 그 삶의 마당에 무시로 흘러내리는 큰 회복과 치유의 아름다운 슬픈 말이 '미안'이 아닐까.
일상의 기울기와 높이의 변화무쌍함으로 인해 신체적·감정적 아픔과 상처가 깊고 넓을 때, 우리는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감정의 딱딱한 굳어짐에 붙잡힌다. 사람은 믿으면 안 되고, 사람은 변하지 않고, 사과하면 상대가 만만히 볼 것이란 허구적 미숙함에 빠진다. 즉 습관이라는 익숙한 어제의 틀로 오늘의 낯선 곤란에 대처하려 한다. 기억하자. 추상적인 결심만으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날의 할머니가 부른 아름다운 슬픈 노래 속 '선생님, 안 나아서 미안합니다'라는 노랫말은 필자가 이번 여름에 겪은 삶에 대한 의미 물음이란 사유적 질병을 치유해 주는 좋은 우산이 되었다. 감히 제안해 본다. '미안함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라는 행동강령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실행해 보자. 이 일은 매 하루를 깨어 살아가는, 살아 있는 나·네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지속적인 경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충일 북-칼럼니스트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