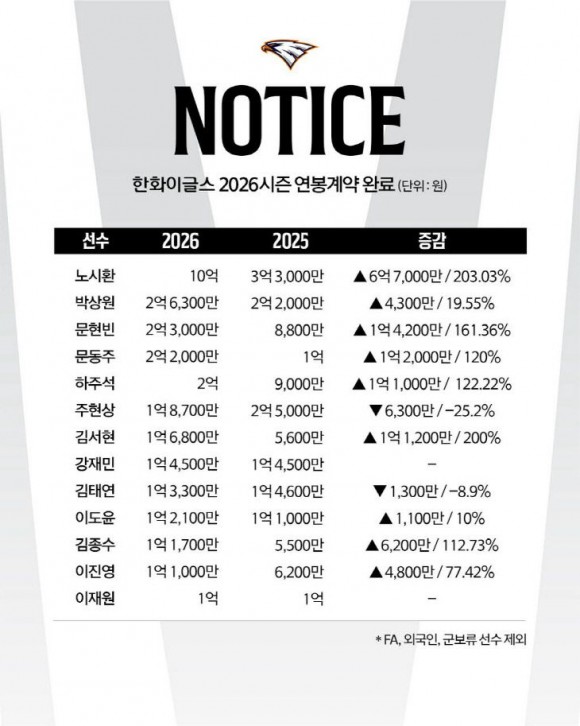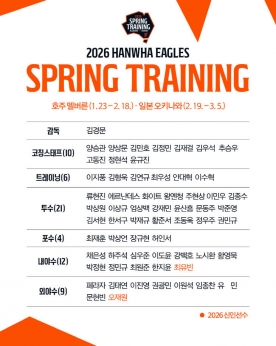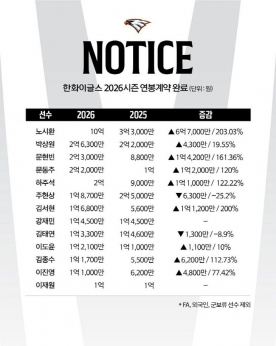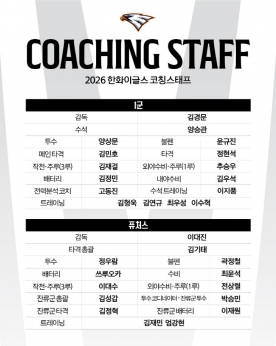|
| 김홍진 한남대 교수/문학평론가 |
원한 어린 피에서 솟아난 '진달래꽃', 소월의 대표작인 이 시의 매력은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는 님의 길에 꽃까지 뿌려주며 '사뿐히 즈려밟고 고이 가시라',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는 초인에 가까운 반응에 있다. 님의 거부 반응은 비위가 상해서 구토가 날 정도다. 이성이 아닌 몸이 본능적으로 싫다. 얼마나 싫으면 구토를 유발할 정도의 역겨운 반응을 보일까. 화자는 그런 님의 떠나는 앞길에 꽃까지 뿌려줄 테니 짓밟고 가라 한다. 이게 아이러니겠지만, 마조히스트라 해도 과한 게 아니다.
봄이 오면 아버지는 달걀을 부화해 알을 내어 먹고, 제사나 식구들 생일 때 두어 마리씩 잡아 상에 올렸다. 그 와중에 부화하지 못한 놈이 곤달걀인데 냄새가 아주 역겹고 여간 고약한 게 아니었다. 아버진 그걸 무슨 보약이라도 되는 양 삶아 맛있게 드시고…. 비위 약한 나는 구토를 연발하며 도망치고…. 필리핀에도 이와 비슷한 '발롯'이란 게 있다. 이놈의 정체는 부화 21일 전후 반(半)병아리 상태의 달걀을 삶은 것이다. 아무튼 곤달걀이나 발롯을 즐기는 이들은 이 역겨운 음식이 달걀보다 영양가가 더 높고 맛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역겨움을 모르던 문명화 이전 네 발 달고 땅에 코 박고 살던 시절로 돌아가고픈 원시적 욕망….
역겨움을 진미로 느끼는 게 어디 이뿐이랴. 지난번 칼럼 '꼴좋다, 쌤통의 심리학'에서 온갖 악취를 풍기던 역겨운 권력자들의 몰락을 목격하며 느끼는 대중의 감정을 '고소하다'는 형용사로 해석했다. 이 또한 마찬가지다. 비약이 좀 있지만 역겨운 악취가 달콤한 고소함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다. 곤달걀이나 발롯처럼 말이다. 하긴 부패하는 사체의 묘사, 배설물을 동원
하고 점액질을 사용해 구토를 유발하는 추의 미, '역겨운 예술'(abject art)도 있으니 이해 못 할 일도 아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온갖 엽기적이고 혐오스러운 악취를 풍기며 구토를 유발하던 권력자들의 추락을 보며 고소함을 느끼는 대중들의 심층심리 역시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역겨운 것을 추종하고 정상적인 것을 역겨워하는 괴팍한 성벽도 이제 보편이 되어버렸다. 이와 반대급부로 고소함을 불러온 권력의 역겨움에 대한 생리적 반응 역시 모종의 인식기능이 작동한 결과다. 몸서리치는 본능적 역겨움이 고소함을 더해 준 것은 그만큼 정치권력이 부패했었다는 걸 의미한다.
밉고 역겨운 감정에서 비롯한 고소함을 즐기는 전통적 방식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데 있
었다. 그러나 이젠 노골적이고 공개적이다. 미디어엔 연일 깨가 쏟아진다. 한 올 숨김없이 권력의 비극과 불행을 즐기는 은밀한 본성이 적나라한 포르노그래피로 현시된다. 그들의 악행을 대입하면 조롱과 비하는 당연지사겠지만, 문제는 고소함의 감정이 생산적 정치력으로 승화되기 위해선 고소한 감정 이상의 이성적인 사회적 실천이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역시 다 보여주지만 아무것도 본 게 없는 역겨운 포르노그래피에 불과할 뿐이다. 김홍진 한남대 교수/문학평론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