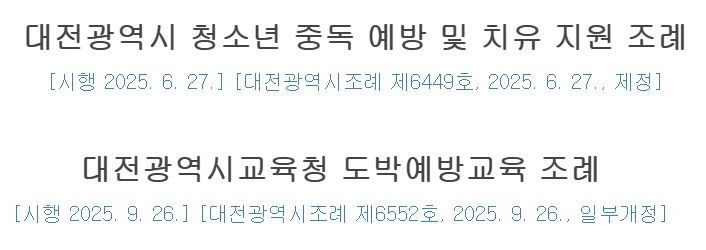|
| 조승환 국회의원./조승환 의원실 제공 |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총 39개소, 3124.7㎢로 서울 면적의 5.16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전담 인력은 전국 합계 7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녹색연합이 올해 4월부터 전국 해양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보호구역 90% 이상이 해양쓰레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 어업, 폐어구 투기, 관광 쓰레기 등이 방치되고 있으나, 해수부와 공단은 "해양보호구역 내 단속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반면, 지자체 전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로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해양폐기물 예방 관리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제한 행위 단속, 폐기물 수거 사업 등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는 이유로 실제 집행은 지자체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에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이 중심이 돼 해양보호구역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관리 예산은 오히려 급감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예산은 2023년 121억 원에서 2025년 67억 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으며, 해양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민간 대행 예산도 축소됐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 모두 조승환 의원실의 '폐어구 투기 등 위협 요인별 관리 대책' 질의에 "현재 보호구역이 위치한 각 지자체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등을 통해 관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감안할 때 중앙의 실질적 관리 역할이 사실상 부재함을 드러낸다.
조승환 의원은 "지자체 의존형 관리 체계로는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 1.8%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국제 공약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해양환경공단과 해수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지자체·지방청·연구기관을 포괄하는 중앙 통합형 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독자제보] "폐업 이후가 더 지옥" 위약금에 무너진 자영업자](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10d/55.jpeg)






![[독자제보] "가게 닫고 나니 진짜 지옥" 비대면 자동주문 시스템 위약금에 무너진 자영업자](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10d/78_20260209010007915000329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