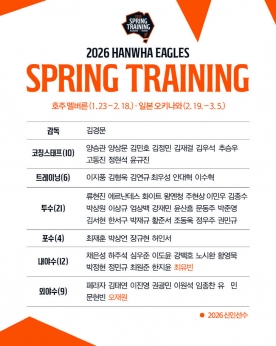|
[3.1운동 100주년 다시보는 대전형무소 100년] 2. 사건 그리고 사람
1919년, 대한민국 전 국토가 일제에 맞서 만세운동으로 들끓었고, 그 뜨거운 외침을 가두기 위해 대전형무소는 세워진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대전의 이야기'다.
이제는 망루와 우물만 남은 중촌동 옛 대전형무소를 기억하는 시민들은 얼마나 될까. 어두운 과거를 버려서는 빛나는 미래를 얻을 수 없다.
총과 칼, 구금의 역사로 얼룩진 대전형무소를 스쳐간 수많은 인물들, 눈물과 억압의 그 이름을 우리는 비극이라고 쓰고 '희망'이라고 읽는다.
대전형무소는 1919년 5월 '대전감옥소'로 개소한 이후 비중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됐다. 도산 안창호, 몽양 여운형, 심산 김창숙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독립투사들이다.
개신유교의 지도자이자, 파리에서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파리장서 운동'을 주도한 심산 김창숙은 1928년 대구형무소에서 대전으로 비밀리 이감된다. 건강악화로 형 집행 정지되기까지 계속해서 옥중 투쟁을 펼쳤다.
독립운동가이자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알려진 몽양 여운형은 1930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옮겨와 2년간 옥고를 치른다.
대전형무소는 1933년 사상범 감옥으로 지정됐다. 이때 도산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 32명이 서대전형무소에서 대전으로 이감되고, 당시 사상범들은 교화 등의 목적으로 닭을 먹여 키우는 양계를 지시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지만 비극은 계속된다. 건국 이후에도 그대로 형무소로 사용되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기 시국 사범들과 전쟁포로 등이 대거 수감된다.
6·25전쟁 발발 직후엔 끔찍한 학살로 얼룩진다. 1950년 6월 대한민국 군경이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관련 수감자, 보도연맹원 등 정치사범 1500여명을 산내면 골령골에서 학살한 것이다. 이른바 산내학살 사건이다.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6·25전쟁으로 대전이 함락될 위기에 빠지자 정부에서 재소자를 처단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군인들이 트럭에 사람을 싣고 인근 야산에 데리고 가서 무더기로 처형했다는 당시 대전형무소 교도관의 증언도 나왔다. 형무소내 우물에는 시체가 넘쳐흘러 다 끄집어 내 화장하는데 10일쯤 걸렸다고 한다.
이어 좌-우익이 서로 번갈아 대전형무소를 장악하면서 상호간 무참한 학살도 이어졌다. 이 모든 비극이 겨우 4개월간의 기록이다.
하지만, 대전형무소의 기록이 모두 핏빛으로 새겨진 것은 아니다.
1968년 동백림 사건으로 수감된 고암 이응노 화백은 이곳에서 수 많은 옥중화 그림들을 탄생시켰다. 먹다 남은 밥풀을 뭉쳐 조각을 만들고 휴지에 간장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그는 고통과 절규로 점철된 감옥소를 예술혼으로 물들였다.
경제학자이자 작가인 신영복은 대전교도소 수감시절 붓글씨를 옥중사사 받았다. 그가 남긴 엽서의 손글씨체를 본떠 탄생한 '신영복체'는 2016년 작고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는 교도소의 문화가 침묵의 문화라면, 교도소의 예술은 비극미가 있다고 적혔다. 긴 징역살이의 절망을 희망의 글로 풀어낸 그의 청춘이 눈부시다.
최근 대전의 한 사립대에선 교내에 세워진 이승만 동상을 놓고 찬반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독재정권에 맞선 역사를 품은 대전에 과오로 얼룩진 그의 동상을 세워둔 것은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의 진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5월 현재,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진상규명 또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고통의 흔적들을 제대로 마주해야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다. 3·1운동 100년을 맞아 대전형무소를 스쳐간 사람과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는 "옛 대전형무소는 독립운동, 6·25전쟁, 민주화 운동을 거친 역사적 공간이다"며 "서대문형무소처럼 복원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기념관·역사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교육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관심을 갖고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
| 1935년 안창호 출옥 후 기념촬영한 것으로 왼쪽부터 여운형, 안창호, 조만식. /독립기념관 제공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고미선 기자
고미선 기자





![[다문화] 국내 체류 외국인, 서울·경기.충남으로 모였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1m/28d/78_2026012801002236400091921.jpg)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전고·한밭중 야구부 김의수·김종국 감독, `미래 야구 유망주들을 위해 최선을`](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1m/29d/20260129010022542000922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