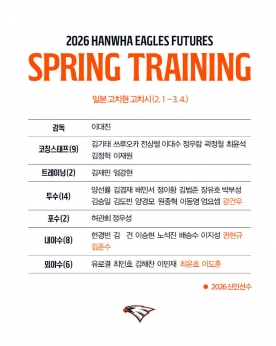|
당시 민주당 경선링엔 충청 출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있었다.
그는 한때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을 턱 밑까지 추격하며 골든크로스를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안 전 지사(21.5%)는 결국 문 전 대통령(57%) 벽을 넘지 못했다.
그래도 당시 그의 선전으로 충청 정치는 여의도에서 외연 확장 가능성을 봤다.
아쉬운 점도 없진 않다. 충청대망론에 대한 안 전 지사의 발언이다. 그는 "지도자를 지역에 가둬놓는 어법"이라고 해석했다.
충청대망론이 대통령 배출을 갈망하는 지역 정서의 총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비단 안 전 지사뿐만 아니다. 비슷한 시기 충청 출신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모 인사도 충청대망론을 같은 시각으로 대했다.
그와 사석(私席)에서 만난 적 있는데 "충청 출신임을 강조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2017년, 충청 정치인들에게 고향은 적어도 '비빌언덕'은 아니었나 보다.
영호남 도움 없이는 용꿈을 꿀 수 없어서 일까? 지나친 패배주의 아닌가? 그때 가졌던 생각은 지금도 뇌리 속에 또렷하다.
올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또 조기대선이 열렸다. 8년 전과 같은 것은 대선링에 충청의 깃발이 나부낀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엔 김동연 경기지사(음성)가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청양)과 김태흠 충남지사(보령)도 등판을 저울질했다.
8년 전과 다른 점도 있다. '샤이충청'이 사라진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선에서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한다. 이 시장도 홀대론 타파를 주장했다.
이런 변화는 어디서 왔을까. 충청의 커진 체급과 무관하지 않다.
일단 유권자가 늘었다. 올 3월 기준 대전·세종·충남·충북 유권자는 476만 5702명이다. 3년 전 20대 대선 때(468만 2246명)와 비교해 8만 3456명 늘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슈는 연일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다. 민주당 3명의 후보는 각론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완전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국회이전 등 '세종시대'를 외치고 있다.
물론 선거 때만 나오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엔진으로 충청이 우뚝서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이 충청을 대하는 인식도 180도 바뀌었다.
8년 전 지역 잠룡들이 고향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충청을 기반으로 정치적 자양분을 얻으려 하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나 과제는 여전하다. 그동안 정권을 번갈아 가며 차지했던 영호남과 같은 응집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
영남의 '우리가 남이가', 호남의 '우덜끼리' 문화는 지역주의 범주로만 해석할 게 아니다.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앞으로는 지역 인사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충청 품앗이' 문화를 확산해 보면 어떨까.
정치의 영역도 이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다.
충청대망론은 곁불을 쬐기보다는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DNA로 무장할 때 가까워 질 것이다.
/강제일 정치행정부장(부국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