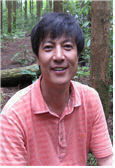 |
| 김홍진 교수. |
세계 인구 11%에 해당하는 약 7억 명 이상이 절대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을 감안하면 개팔자 상팔자다.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야사바랭은 〈미식 예찬〉에서 "짐승은 먹이를 먹고, 인간은 음식을 먹는다"고 말했지만, 일본의 헨미 요는 〈먹는 인간〉에서 "사람도 가끔 짐승과 똑같이 먹이를 먹는다"고 말한다. 어떤 이들, 비록 살아 있다고는 하나 정상에서 배제된 열외인간 '호모 사케르'(조르주 아감벤, 〈호모 사케르〉)의 벌거벗은 생명들에게는 먹는 게 생존을 위한 절박한 사투이기 때문이다.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산해진미의 맛 기행, 팔자 좋은 호사가의 미식과 포만은 가난과 기아, 분쟁과 배고픔이 없는 행복한 풍요를 구가한다. 이런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다른 맥락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음식, 그야말로 개밥만도 못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을 찾아 나선 기행이 〈먹는 인간〉이다. 이 르포르타주는 미식과 포만, 음식이 가진 문화인류학적 상징을 탐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매우 예외적인 슬픈 맛 기행이다. 오직 생존을 위해 썩은 악취로 구토를 유발하는 개밥만도 못한 음식과 종교 윤리적으로 금지한 대상을 요리해 먹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굶주림에 집중한다. 인간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헨미 요는 세계 곳곳에서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의 정치, 사회, 역사적 맥락을 탐구하며, 넘치는 미식과 풍요의 세기에 사람들은 얼마나 못 먹을까? 분쟁은 또 먹는 본능을 어떻게 짓누를까? 따위를 사유한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개보다도 못한 밥을 먹는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선향(線香) 냄새 진동하는 뒷골목 포장마차 쟁반에 볶음밥 브리야니와 닭고기 등등이 쌓여 있다. 구토를 유발하는 이 역겨운 음식들은 부자들이 먹고 버린 찌꺼기로 만든 것이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 키탄그라드 산속 동료와 산 아래 주민을 잡아 인육을 먹은 일본군 패잔병, 내전이 한창인 유고 자그레브에서 돼지고기를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이슬람교도 등등…. 이쯤에서 음식이 지닌 신성성과 인간 존엄성은 무참하게 무너진다.
브리야니, 식인, 돼지고기 등등은 음식이 지닌 상징적 가치의 파괴라는 동일 지정의 의미다. 서로 다를 게 없는 의미를 내포한다. 헨미 요와 마찬가지로 먹는다는 행위의 정치, 사회, 역사적 의미와 인간 생존 본능을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제리코의 그림 〈메두사호의 뗏목〉이 으뜸일 것이다. 앙가주망의 효시라 해도 무방할 이 그림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게 만드는 부패한 정치권력의 무능과 탐욕이 빚은 참상의 비극을 그리기 때문이다. 헨미 요의 이르포르타주는 마치 제리코의 그림을 알몸의 언어로 풀어낸 것과 진배없다.
음식은 다른 생명의 죽음으로 이룩한 것, 신성한 상징이다. 인간만이 음식에 생존이나 영양을 초월한 상징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 까닭에 음식의 신성함과 인간 존엄성은 비례한다. 이 등가 관계의 파괴는 대개 정치 사회적이라는 사실을 헨미 요는 말하고 싶은 것이다. 첨언하면 마들렌 한 조각을 홍차에 담아 입술에 가져갔을 때, 어릴 적 맛과 향으로부터 '나'였던 본래의 '나'를 다시 찾는 프루스트와 미식가 브리야사바랭을 무색하게 한다. 그럼에도 음식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잊게 해주고 영혼에 위로가 되는 것도 없다.
김홍진 한남대 교수/문학평론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