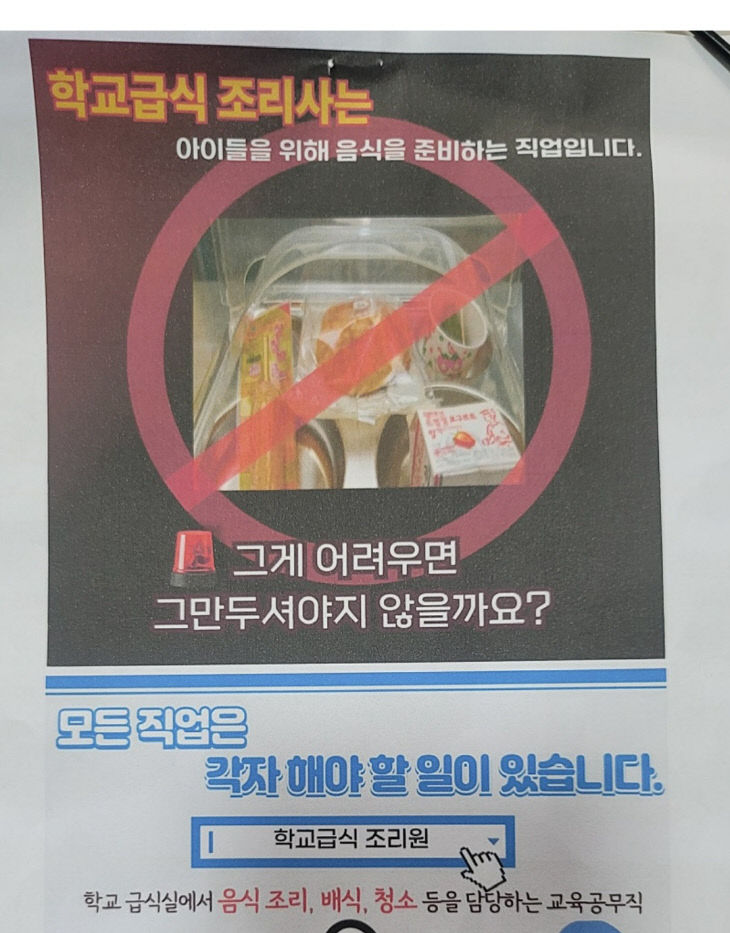|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특구 지정의 다른 의미에는 기존 국가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한다는 점도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실증 총괄을 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ST 등 11개 우주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대전테크노파크는 지원과 운영을 맡는다. 기존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와도 연결 지점이 있다. 우주산업 신산업·신기술은 성장성과 파급력이 큰 분야다. '뉴스페이스' 산업화 생태계 조성 등 다방면으로 효과를 살려 잘 써야 한다.
우주산업과의 연관성이 대전은 어느 지역보다 깊다.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부터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 등 우주개발의 터를 다진 곳이다. 2025년 국가산업대상 우주산업 선도도시 부문 대상에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적·물적 인프라와 기술력에서 대전은 여전히 우주산업의 거점이다. 소중한 자산과 위상을 인위적으로 달라지게 해선 안 된다. 2030년 대전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과도 조합해 글로벌 리더의 비전을 실현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이득이다.
6·3 대선 공약에도 과학수도 대전을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운다는 구상은 들어 있다. 그런데 우주산업 경쟁력과 산업계 연계 강화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피상적이다. 항공우주산업에 연고가 있는 대전의 보유 인프라를 달 착륙과 화상 탐사에서도 활용해야 한다. 탄탄한 우주산업 기반만 봐도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의 대전 설치는 당위성이 충분하다. 우주 추진 기술의 원천 연구를 포함한 K-우주산업 기반 다지기는 대전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S석한컷]대전팬들의 로망 ACL원정 갈 수 있을까? 그럼 당연히 가야지!](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8m/21d/20250814001526426_1.jpg)
![[드림인대전] 윤하랑, 우상혁의 대를 잇는 육상의 별을 꿈꾸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8m/21d/20250812010009293000383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