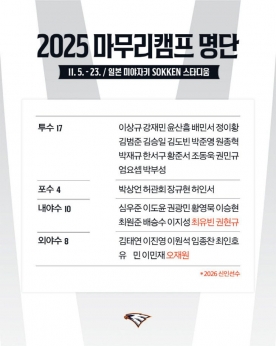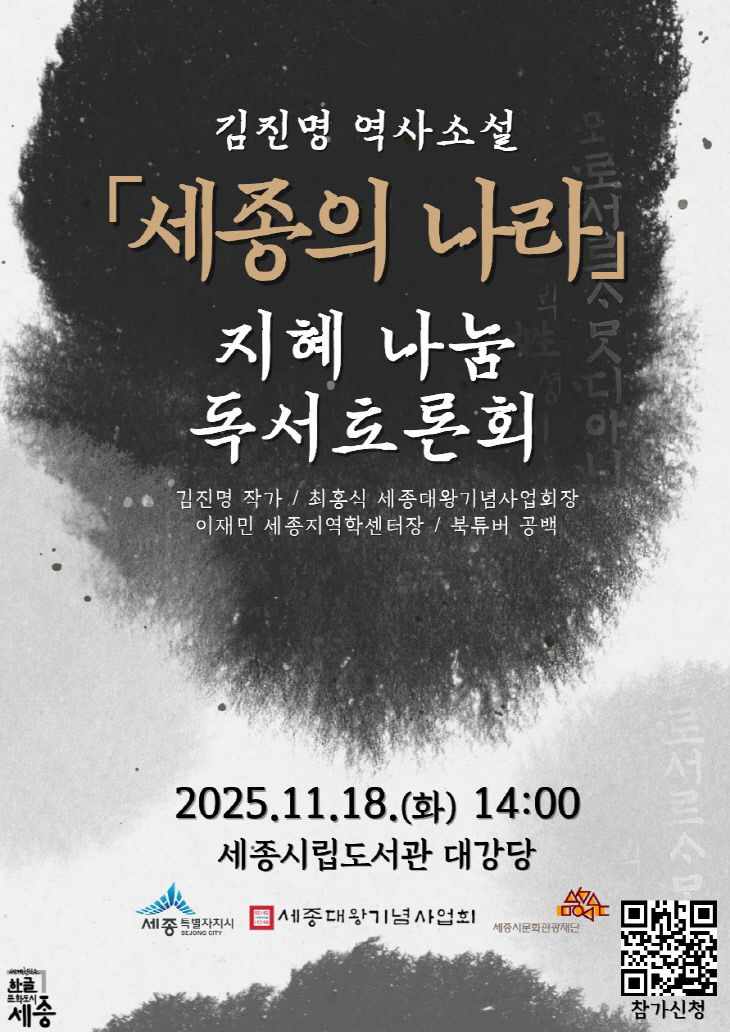|
| 김정식 기자<사진=김정식 기자> |
이 문장은 프랑스 정치철학자 조제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의 말로 알려져 있다.
무릇 어떤 정부든, 그 민중이 선택한 결과라는 뜻이다.
전제정치가 지배하던 시대에 던져진 이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한국의 현실을 너무도 날카롭게 꿰뚫고 있다.
오는 6월 3일,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다.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를 반대하든, 그날의 선택은 곧 이 나라의 얼굴이 된다.
누가 무능하고, 누가 부패했으며, 누가 소신 없고, 누가 말뿐인 사람인지.
그 모든 평가 이전에, 그들은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다.
그렇다. 시장도, 군수도, 국회의원도, 결국은 그 지역의 민심이 모여 낸 결과다.
누군가가 뽑은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뽑은 것이다.
우리는 때로 투표장을 나서며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아니지 않나." 하지만 결국 한 표는 한 표고, 다수는 선택을 증명한다.
무지한 정치인은 무지한 민심이, 이기적인 지도자는 이기적인 유권자가 만든다.
우리는 정부를 비난하며 동시에 정부의 일부로 살아간다.
권력을 비판하면서도, 권력의 그림자에 편승하려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정치가 썩었다고 말하면서, 썩은 정치를 만든 선택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정치는 사회의 거울이다.
정치를 욕하기 전에 그 사회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무능한 정치가 반복된다면, 그건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유권자의 반복된 선택일 수 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치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반영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언어와 인식, 그리고 책임의식이 그대로 제도화된 것이 정치다.
그러니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정치가 왜 가능했는지를 묻는 것이 먼저다.
왜 그런 인물이 반복해서 당선되는지, 왜 무능을 용인하고 부패를 외면하는지가 핵심이다.
정치가 싫다고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 정치가 왜 그 모양인지, 내 삶의 태도와 언어, 공동체 기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누가 당선됐느냐가 아니라, 누가 뽑았느냐의 기록이다.
선거란 건 결국 집단 자화상이다.
그것이 부끄럽다면, 거울을 바꾸기 전에 얼굴을 먼저 씻어야 하지 않겠는가.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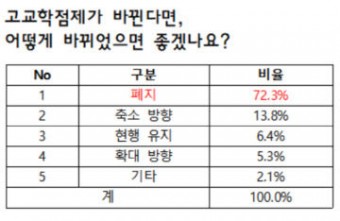









![[박현경골프아카데미 시즌-3]공이 잘 나가지 않느냐 여봐라 `주리를 틀어라`](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11m/08d/20251107001410235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