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3년 정부세종청사에 자리잡은 해양수산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숱한 변화를 겪어온 해양수산부의 운명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정원 규모는 세종시 본부 600여 명과 소속기관 및 책임 운영기관 3200여 명을 포함한 약 3800명 조직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북극 항로 개척이란 국가적 과제 수행을 통해 더 큰 조직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부터 현재까지 굴곡진 연혁은 해수부의 최적 입지를 신중 모드로 전환하게 한다.
청 단위 기능으로 서울에 있을 당시에는 '정부대전청사(1996년 출범)'로 이전을 확정지었고, 이후 김영삼 정부 들어 현재의 해수부로 승격 후 서울에 잔류했다. 노무현 정부는 박정희 정부와 같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담아 2005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고시에 '해양수산부'를 함께 담아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애 발언이 다시 회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폐지부터 부산시 이전 움직임을 놓고, 당시 노무현 해수부 장관은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에 따로 사무소를 둬야 하고, 장관은 거의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비효율 문제를 들며 부산 이전에 반대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졌고, 결국 해수부는 2013년 정부세종청사에 안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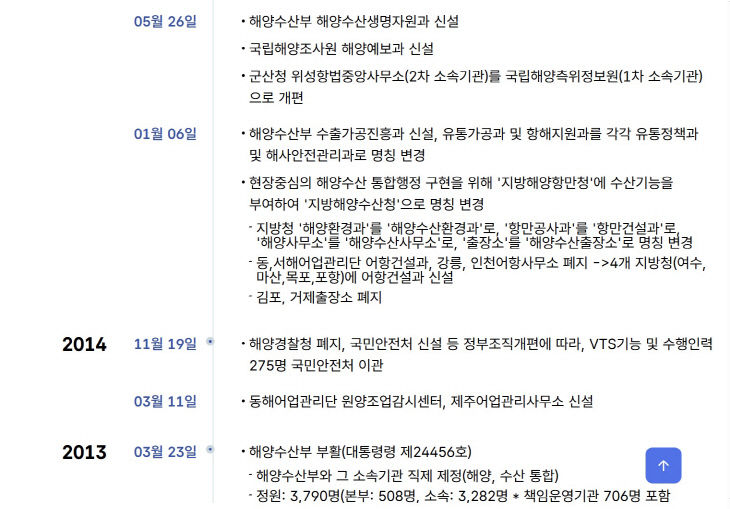 |
| 해수부는 2013년 부활해 세종시에 12년 간 둥지를 틀고 있다. 사진=해수부 누리집 갈무리. |
"부산으로 가면, 장관부터 국·과장, 사무관까지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길국장·과장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고 본 셈이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효율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순인데, 해수부의 부산 이전 논란은 역사의 퇴행에 가깝다.
이미 2013년 해수부 이전의 소모적 논쟁을 겪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독선적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당시 부산과 전남, 인천이 유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해수부 직원을 넘어 각 당 정치 인사들이 2026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란 비판을 쏟아내는 배경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같은 시각을 내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부산지역 3선인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2026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세종(55.6%) vs 부산(40.1%)' 득표율 차를 실감했다. 부산을 가져와야 장기 집권 플랜에 다가설 수 있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
| 전국공무원노조 해수부지부는 '일방적 해수부 이전 결사 반대', 행정효율과 타당성 검토 없는 졸속 이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대전, 일류 문화도시의 현주소] 국립시설 `0개`·문화지표 최하위…민선8기 3년의 성적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14d/117_2025121401001223600052381.jpg)



![[대전, 일류 문화도시의 현주소] 국립시설 `0개`·문화지표 최하위…민선8기 3년의 성적표](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14d/78_2025121401001223600052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