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근찬 우송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 |
대학 현장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작년부터 필자도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내가 공부하는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번 1학기 필자는 인공지능을 대학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어떤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관련 전공 수업에 참고되는 질병과 건강에 관련된 유명한 여러 책자를 학생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 미셀 푸코의 임상 의학의 탄생, 어떻게 죽을 것인가?, 돌봄의 사회학, 엔트로피 등 책자에서 한두 챕터를 발췌해서 읽고, 박완서 소설가의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이라는 질병을 모티브로 한 소설을 읽었다.
학생들에게 직접 책을 읽는 경험을 통해 지식의 자극을 주고 싶었던 필자의 의도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아쉬움을 남겼다.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는 경험은 분명 소중했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보였다.
인공지능과 대화할 때는 단 한 번의 질문으로 모든 답을 얻으려 하기보다,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답변을 보고 추가적인 질문을 여러 번 던지며 소통해야 내가 원하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꼬리 질문'을 통해 인공지능의 답변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는 곧 좋은 발표 내용으로 이어진다.
대학 전공 교육에서 이미 정해진 답을 알려주는 것은 대학교수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뛰어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구하며,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 그리고 인간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유명한 사회학자인 엘레나 에스포지토는 인공지능의 특별한 소통 방식을 '인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설명한다.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무언가를 이해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계산하고 처리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 심지어 사람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까지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에게도 약점은 있다. 바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은 때때로 사실과 다르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정보를 그럴듯하게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거짓말을 줄이고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질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인공지능이 준 정보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하며, 때로는 인공지능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져서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어내야 한다.
사실 이렇게 질문하고, 불확실한 것을 파고들어 의미를 찾아내는 삶의 방식은 인간의 오랜 특징이다. 인간은 혼자 살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행동한다. 이 과정은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혼란스럽다. 인간이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행위와 말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고, 세상의 의미를 만들어간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질문하는 것은, 과거부터 인간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의미를 찾아왔던 방식의 연장선에 있다. 인공지능의 거짓말을 걸러내고,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처럼 본질적인 '질문하는 삶'의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대의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의미를 함께 만들어나가고 공유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인간다움의 본질일 것이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질문하는 삶'이다. /이근찬 우송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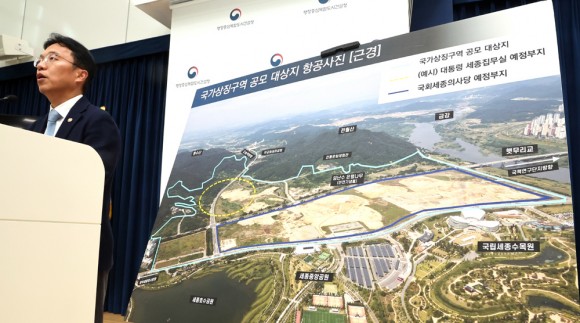











![[드림인대전] 초등생 윤여훈, 멀리뛰기 꿈을 향해 날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8m/31d/20250826010018644000791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