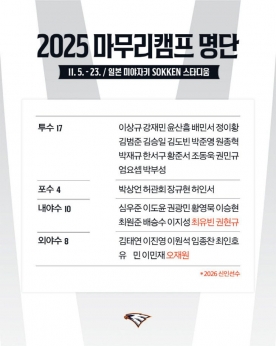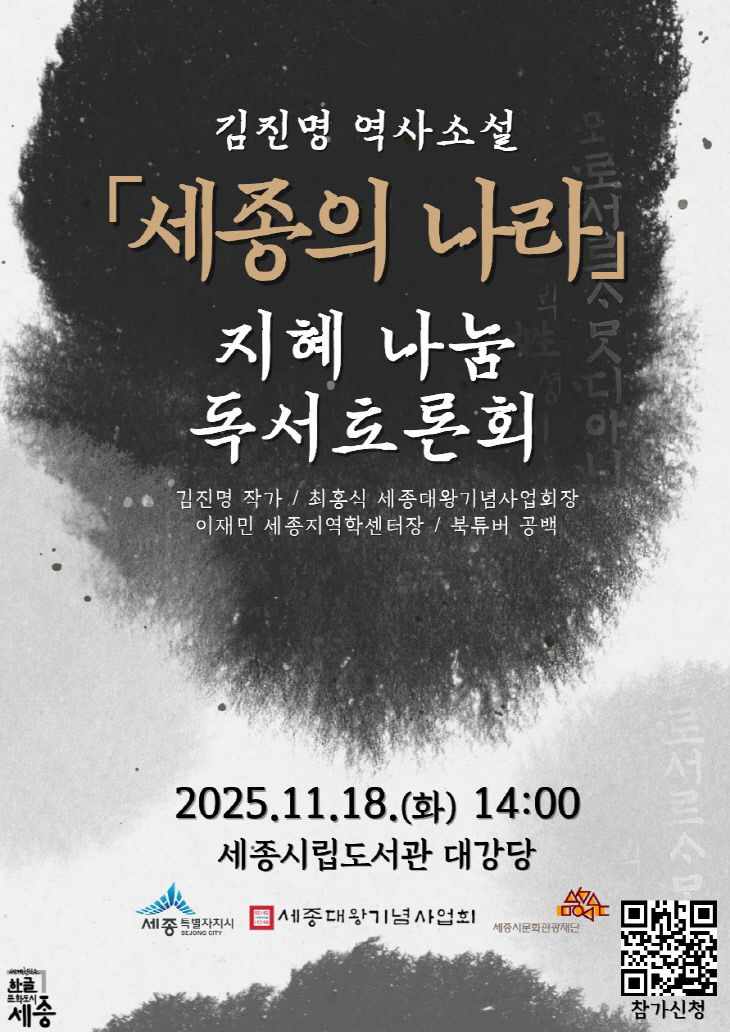대전의 여성 피해자는 그동안 112 신고 등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범죄의 사슬로부터 생명을 지켜진 못했다. 도를 넘는 폭력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피해자 구제에 취약한 부분은 사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상습 폭력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이별을 실행하지 못할 때도 보호받아야 한다. 어느 경우든 법의 우산으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다. 강화된 개입과 대처가 늘 안타까운 대목이다.
현실의 교제폭력 앞에 '피해자 중심주의'는 공허한 지침이 되기 쉽다. 며칠 사이 꼬리를 문 스토킹 범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하루 평균 200건 이상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선제적 격리를 위해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과 전자장치 부착 요청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더 적극 수용해야 한다. 안전조치 신청이 승인되고 신변 경호까지 이뤄진 예는 극히 드물다. 안일한 판단은 또다른 피해자를 만든다. 불안감 때문에 사설 경호업체에 기댄다면 공권력이 오작동한다는 증거일 수 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는 폭력의 양태가 다른 것이 교제폭력이다. 별도의 교제폭력 규제(처벌)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 지원기관 연계 등을 규정해 지자체 조례를 추진하는 곳도 있다. 관계성 범죄는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고 발생 초기부터 개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범죄는 재연된다. 사회 통념과 달리 여성이 가해자인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일상이 된 교제폭력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응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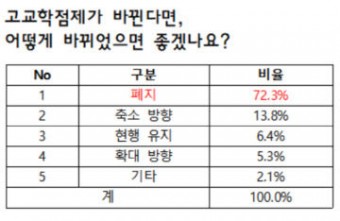









![[박현경골프아카데미 시즌-3]공이 잘 나가지 않느냐 여봐라 `주리를 틀어라`](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11m/08d/20251107001410235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