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정민 미술평론가 |
조선시대 선비들은 매미를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매미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었다. 맑은 이슬만을 먹고, 탐욕 없이 잠시 울다 사라지는 존재였기에 곧 군자의 상징이 되었다. 청렴하고 올곧은 인격의 은유로 시문과 그림에 자주 등장했다. 매미의 존재는 여름의 계절감을 넘어, 자연을 통해 인격을 닦고자 했던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상징이었다.
겸재 정선은 <송림한선> 작품 속에 소나무와 매미, 두 군자의 상징을 한 화면에 담았다. 진경산수의 대가 정선은 대작 산수뿐 아니라 소품에서도 절제된 자연미를 구현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소나무 가지 위, 정갈하게 앉은 매미 한 마리,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구도와 넉넉한 여백 속에서 매미의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정선은 자연의 거대함보다는 순간의 기운과 조용한 생명을 포착했다. 탐욕 없이 잠시 울다 사라지는 매미처럼, 한 폭의 그림에도 절제와 담백함이 깃들어 있다.
조선 후기 순조 연간에 활동한 손암 정황의 <매미도>에서는 매미가 화면의 중심 주제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림은 대각선으로 뻗은 버들가지 위에 앉은 매미를 담고 있다. 버들가지와 잎에는 청록의 담채가 은은히 더해져, 화면 전체에 여름의 청량감이 스며든다. 나무와 잎은 비교적 간략히 묘사되었지만, 매미는 세밀하고 공들인 붓질로 그려져 화면의 시각적 초점이 자연스럽게 매미에 집중된다. 여름이면 마땅히 존재해야 할 생명, 그러나 결코 탐욕적이지 않은 절제된 자연의 일면을 그려낸 것이다. 문학에서도 매미는 청빈과 고결함의 정신을 품었다. 조선 연산군 시절 시인 이행은, 매미가 이슬만 먹고 탐욕이 없으며 오직 맑은 소리로 존재를 증명하는 군자라 노래했다.
오랜 세월 군자의 품격으로 칭송받았던 매미는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저녁 무렵 풀숲에서는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외국인들이 종종 목격된다. 비닐봉지와 플라스틱병에 담긴 매미 유충은 술안주나 간식으로 소비될 예정이었다. 도시화가 진행된 한국에서 매미는 사라지는 풍경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거리와 시장에서 손쉽게 유충이 소비된다. 매미는 법적 보호종이 아니기에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이 광경은 자연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를 선명히 보여준다. 조선의 선비들은 매미를 인격과 계절의 상징으로 품었지만, 오늘날 일부에서는 손쉬운 자원으로 소비된다. 같은 자연물도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띤다.
한국의 여름은 매미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 매미의 울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쌓아온 문화의 기억이다. 조용한 숲에서 매미 소리를 듣고, 화폭에 담고, 시로 읊조리던 그 기억 속에서 여름은 살아 숨 쉬었다. 하지만 지금, 그 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무분별한 채집과 조용해진 공원이 늘어난다면, 여름은 껍질만 남고 속이 비어버릴지 모른다. 매미는 계절이 품은 순수함과 조화의 상징이다. 매미가 사라진 풍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울음이 다시 번질 때, 비로소 여름은 완성된다. 한 폭의 그림처럼 청명한 울음이 다시 숲에 스며드는 그날, 여름의 진경 또한 우리 곁에 머물 것이다. 최정민 미술평론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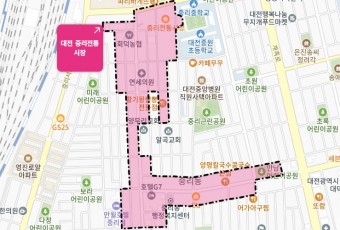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전 동구 소프트테니스팀, 전국 최대 강팀으로 `우뚝`](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1m/11d/20260107010004431000178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