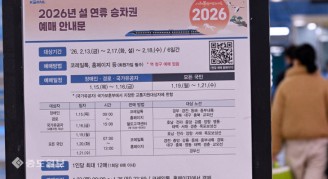|
| 임병안 사회과학부 기자 |
기자는 전날 저녁 사고가 발생하고 다음날 점심시간이 가까운 때에 현장에 도착해 사고장소를 바라볼 수 있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카메라를 챙겨 우선 하천으로 향했다. 구조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사고 주소는 기러기공원의 주차장을 가르켰고, 하천 안에서 어느 지점에서 사고났는지는 모르는 상태였다. 우선 사진촬영부터 시작해 맑은 하천에 물이 얕게 흐르고 저 뒷편에 무엇인가 써있는 현수막이 있는 다소 밋밋해보이는 장면이 카메라 앵글에 담겼다. 장소를 옮겨 조금더 하류로 내려가니 '수영금지'라는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는 현장이 나왔고 이번에는 그 현수막과 하천을 한 앵글에 담아서 사진을 촬영했다. 또 구명환이 담긴 구명상자와 하천을 한 프레임에 담아 위험한 장소임을 표현하는 사진을 추가로 촬용했다. 4명이 사망한 현장을 설명하기에는 후자의 사진들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주변 탐문을 시작했다.
앞서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하천으로 걸어갈 때 저쪽에 흰색 천막이 보였으나 주변 식당가에서 내놓은 평상이 있을 것으로 막연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주변을 탐문하면서 천막에 다가가서야 그곳에 안전요원이 평소에 상주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았다. 해수욕장처럼 화려하고 눈에 쉽게 뛸 수 있게 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속으로만 했다. 안전관리요원이 30m 간격을 두고 두 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피해자들이 무릎 높이도 되지 않는 지점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다소 이해되지 않은 설명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관리자를 만나서야 사고장소가 '수영금지' 대형현수막 내걸린 위치와 다소 떨어진 하천의 중간쯤 위치라는 것을 알았다. 이때는 이미 사고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온라인에 속속 올라오는 시점이었는데 사진 대부분 '수영금지' 대형현수막을 강조하고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이동하면서 곰곰히 생각해봤다. 피해자들은 주차장에서 하천으로 곧장 향하는 동안 '수영금지' 대형 현수막을 못 보았거나, 보았더라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내 발밑에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라고 여기지 않았을 수 있는데, 보도는 그들이 마치 그러한 경고를 눈앞에 두고도 수영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하는게 정당한 것일까. 그들도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천막을 식당에서 설치한 것으로 여겨 평온한 상태로 이해했던 것은 아닐까. 급기야 그날 오후에는 안전관리자가 물놀이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구두로 경고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까지 보태졌다. 누구도 그들에게 안전을 경고하거나 당부한 이들이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경차찰의 수사 결과다.
초기 보도가 '수영금지' 대형 현수막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전관리자의 구두경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서 이뤄지다보니 현장의 안전문제는 다루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보냈다는 반성을 안 할 수 없다.
임병안 사회과학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전 동구 소프트테니스팀, 전국 최대 강팀으로 `우뚝`](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1m/14d/20260107010004431000178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