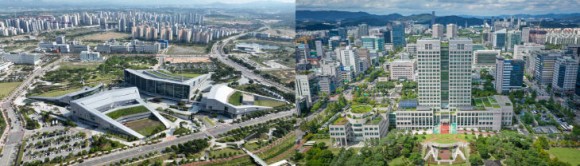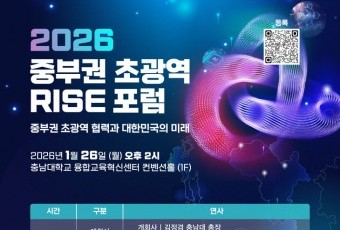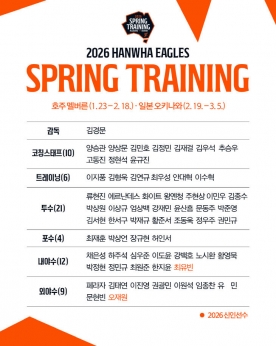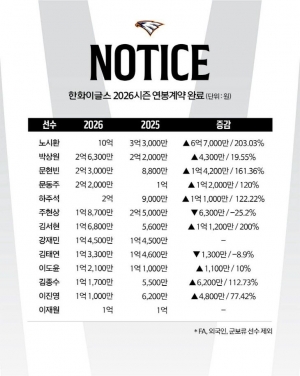|
| 윤경준 배재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한국크루즈포럼 학술위원장) |
그러나 북극항로는 여전히 여름철에만 활용 가능하고, 해빙과 기상 변화로 안전성이 낮은 편이다. 항만 등 구조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쇄빙선 건조와 높은 보험료 탓에 경제성도 제한적이다. 러시아의 통제와 북극 연안국 간의 주권 분쟁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다.
더불어 환경 규제 강화와 친환경 선박 전환 부담은 기술적 과제로 남는다. 결국 북극항로는 잠재력만큼이나 제약도 크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항로라고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당분간은 대규모 상업용 물류 항로보다는 시험적 운항, 연구·관광용 크루즈, 제한적 자원 수송 위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에서도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북극항로의 미래를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크루즈에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는 북극 크루즈가 빠르게 늘고 있다. 승객들은 거대한 빙산과 북극곰을 눈앞에서 만나고, 기후 변화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다. 단순한 휴양을 넘어 학습과 체험의 성격이 강하다.
이 시장의 성장세는 뚜렷하다. 북극 크루즈 승객 수는 2005년 약 5만 명에서 2016년 8만 명으로 늘었고, 알래스카 지역에서는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크루즈를 이용한다. 스발바르 제도에서는 한 해 크루즈 관광으로 3억 크로네(약 35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 특히 소규모 탐험 크루즈 승객은 1인당 지역에서 80만 원 이상을 지출해, 대형 크루즈보다 훨씬 높은 소비 효과를 낳는다. 북극 크루즈가 단순한 호기심 여행을 넘어 지역 경제의 '효자 산업'이 되는 이유다.
그러나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다. 크루즈는 교통수단 중에서도 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극지방 크루즈 승객 한 명이 남기는 탄소 배출은 약 5톤, 같은 거리를 비행기로 갈 때보다 세 배 많다. 황산화물 배출량은 자동차와는 비교조차 어렵다. 유럽의 한 크루즈선이 내뿜는 양이 한 나라 전체 자동차보다 많다는 조사도 있다.
북극에서는 블랙카본, 즉 배기가스 속 검댕이 문제다. 얼음 위에 쌓이면 태양빛을 더 빨리 흡수해 해빙 속도를 높인다. 북극해 여름철 얼음 면적은 이미 4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크루즈의 인기가 기후 위기의 증거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따라서 북극 크루즈의 미래는 친환경 전환에 달려 있다. 다행히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노르웨이 선사 허티그루텐은 하이브리드 추진 크루즈선을 내놓았고, 일부 탐험선은 태양광·풍력을 활용한 초저배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2025년부터 북극에서 중유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스발바르 제도는 승객 200명 이상의 대형 선박의 보호구역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관광 관리도 필요하다. 특정 항구에 대형 크루즈가 몰리면 지역사회는 수익보다 부담을 더 크게 떠안는다. 알래스카 일부 도시는 입항 제한과 교통 통제를 도입했다. 북극 관광이 진정한 미래 산업이 되려면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환경 보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절대적이다.
북극 크루즈는 단순한 사치 여행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바다를 이용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빠른 물류 길만 좇을 수도, 단기적 관광 수익에 매달릴 수도 없다. 친환경 기술과 국제 규제,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이 함께해야 한다.
북극은 기후 위기의 최전선이자,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의 미래를 시험하는 무대다. 북극항로 위의 크루즈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인류의 선택을 실은 항해선이다. 그 항해가 지구와 사람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 되길 기대하며 우리 정부에서도 북극항로의 미래를 크루즈를 통해 찾아 나가길 바라본다. /윤경준 배재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한국크루즈포럼 학술위원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