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휴가는 아들이 결혼하는 당일 딱 하루였다. 아들의 혼례 불과 하루 전날에도 야근을 들어가야만 했다. 그런데 감사의 변수가 발생했다. 평소 호형호제하며 가깝게 지내는 직장상사께서 대근(代勤)을 해줄 테니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닌가.
"내가 야근하면 되니까 집에서 푹 쉬어요." 그 같은 파격의 배려에 당연히 '깜놀'할 수밖에. "저 때문에 쉬지 못하신다면 말도 안 되죠. 말씀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허나 그분의 막무가내 '의리의 황소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얼마 전 내가 긴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점심시간부터 근무(그날도 야근이었다)를 부탁한 적 있었지요? 그에 따른 일종의 반대급부라고 생각하고 내 말대로 하세요!" 순간 "피할 수 없는 것은 포용해야 한다"는 셰익스피어의 말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만요. 아무튼 정말 고맙습니다! 혼례 마치고 저녁 근사하게 사겠습니다." 덕분에 지난 주 금요일부터 휴가를 누릴 수 있었다. '공짜로' 하루를 쉰 다음 날인 토요일엔 예정대로 아들의 결혼식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은 불과 한치 앞조차 가늠할 수 없다고 했던가. 이튿날 오전에 장인 어르신께서 그만 영면하셨지 뭔가! 슬픔에 잠기면서도 장례절차에 몰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불어 직장에도 통보를 하여 닷새간의 휴가를 허락받았다.
거기에 정상적 업무의 경우, 사흘 연속 근무 뒤엔 이틀을 쉰다. 이러한 구조인 까닭에 도합 아흐레의 '어떤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 난생처음 누려본 아흐레의 긴 휴가 덕분에 장인 어르신의 상을 잘 치를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중간에 삼우제(三虞祭)에 이어 사찰에 가서 '49재'의 수순인 매주 토요일마다의 첫 제(祭)까지 올리고 왔기에 홀가분하다.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는 49재(四十九齋)를 중시한다.
이는 망자를 위하여 돌아가신 날로부터 49일간 그 넋을 위로하고 명복을 빌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찰에서는 고인의 영혼이 극락세계로 가도록 스님이 염불로써 그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절차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제사의 의미가 있는 제(祭)자를 넣어 '49제'라는 말도 있지만 '49재'든 '49제' 역시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터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육체)은 없어지고 영혼(넋 또는 혼)만 남게 된다고 한다.
이 영혼(불가에서는 '영가'라고 함)은 죽은 날부터 49일간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중간의 중음신(中陰身 = 사람이 죽은 뒤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상태)으로 있게 된다. 그리곤 살아 생전 알게 모르게 지은 3가지 업장인 삼업(몸,입,생각으로 지은 죄)의 죄에 대하여 7일에 한번 씩 7번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현세계(現世界)라고 하는 반면, 죽은 사람이 사는 세상을 사후세계(死後世界)라고 한다. 이곳에는 열 분의 대왕(十大冥王)이 계신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곳으로 들어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49일간 일곱 분의 대왕이 영가를 심판한다고 했다. 스님이 49재를 하는 동안의 염불 내용은 그래서 자명하다. 명부대왕의 심판을 받을 때 좋은 판결을 받도록 하는, 이를테면 변호사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리곤 망자를 위하여 그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면서 극락왕생을 기원 드리는 의식이다. '49재'는 6세기경 중국에서 생겨난 의식으로 유교적인 조령숭배(祖靈崇拜) 사상과 불교의 윤회(輪廻) 사상이 절충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 7일마다 불경을 외면서 재(齋)를 올려 죽은 이가 그 동안에 불법을 깨닫고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비는 제례의식이다. 그래서 칠칠재(七七齋)라고도 부르며, 이 49일간을 '중유(中有)' 또는 '중음(中陰)'이라고 한다.
이 기간에 죽은 이가 생전의 업(業)에 따라 다음 세상에서의 인연, 즉 내생(來生)이 결정된다고 믿는다. 원래 불교의 '무아설(無我說)'에 따르면 개인의 생전의 행위 자체에 대한 업보(業報)는 그 사람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도 자녀 또는 그 후손 누구에게도 전가될 수가 없으며 전가시킬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교사상은 이 49일 동안에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하여 그 후손들이 정성을 다하여 재를 올리면, 죽은 부모나 조상이 후예들의 공덕에 힘입어 보다 좋은 곳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또 그 조상의 혼령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 '무아설'과는 다른 육도(六道) 사상적 해석에 따르면 모든 중생은 육도, 즉 천상(天上)·인간(人間)·축생(畜生)·아수라(阿修羅)·아귀(餓鬼)·지옥도(地獄道) 등 여섯 세계를 윤회하고 있으므로 죽은 가족이 이 중 이른바 삼악도(三惡道; 지옥도·아귀도·축생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는 기도 행위가 '49재'라는 예기도 있다.
가족 중에서 상을 당하게 되면 누구라도 고인께서 좋은 곳에 가시길 바라는 마음은 하나로 집약된다. 이는 비단 가족 뿐 아니라 친구나 지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49재의 중차대함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거짓부렁 세상, 그까짓 거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냉소적 사람도 있지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일지라도 일단은, 그리고 기본적으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볼 일이다. 그럼에도 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아니면 또 다른 핑계로 자살까지 불사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불교 뿐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자살을 살인과 동일하게 본다. 이는 자살은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인 까닭이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사람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다.
49재를 집전하신 스님께서도 자살한 영혼은 저승에 가지 못하고 예외 없이 구천을 떠돌게 마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한 설왕설래 이전에 이승에서의 삶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순간의, 그리고 어쩌면 극구광음(隙駒光陰= 흘러가는 세월(歲月)의 빠름은 달려가는 말을 문틈으로 보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인생(人生)의 덧없고 짧음을 비유하는 말)보다 더 한 찰나(刹那)에 다름 아니다.
혹자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며 49재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49재가 없었다면 가족화합 또한 있었을까? 라는 게 사견이다. 장례는 특성상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다.
따라서 설혹 가족 간의 불화와 상충이 있었다손 쳐도 장례식을 기화로 다시 만나 화해와 배려의 물꼬로 바꾸는 경우도 자주 봐왔다. 비온 뒤의 땅이 굳어지듯 더 견고한 가족애의 구축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고생과 고통을 받는 삶을 산다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필자도 매한가지다. 그렇긴 하더라도 내생(來生)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으로의 환골탈태 환생을 바란다는 건 아니다. 다만 필자가 선하게 살면 가족들도 덩달아 그 삶이 평안한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삼라만상(森羅萬象)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정말이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어쨌든 휴가는 끝났다. 오늘은 다시금 출근하는 날. 새벽 첫 발차의 시내버스에 올랐다. "난생 처음 9일 동안이나 휴가를 써먹었으니 더 열심히 일하슈!"라는 음성이 어디선가 빙의(憑依) 로 우렁차게 들려오는 듯 했다.
홍경석 / 수필가 & 칼럼니스트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의화 기자
김의화 기자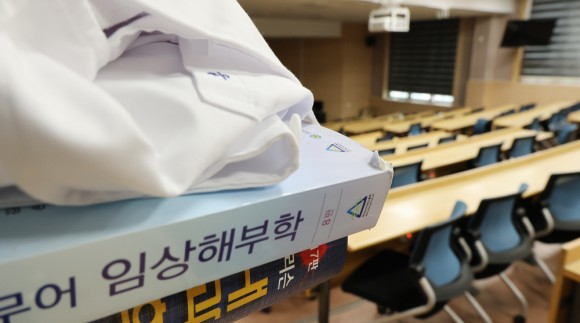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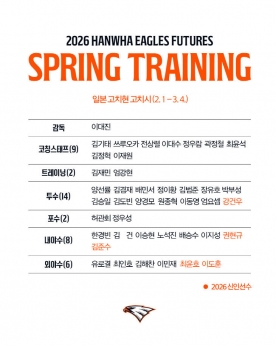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전고·한밭중 야구부 김의수·김종국 감독, `미래 야구 유망주들을 위해 최선을`](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1m/31d/20260129010022542000922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