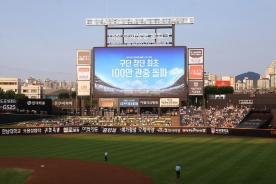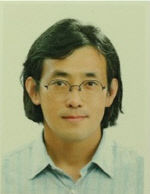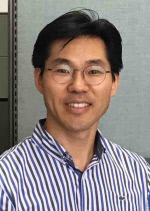 |
|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
그러나, 헬멧착용 의무화 시행에 앞서 몇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법을 시행해야 하는 지자체에서는 세부 정책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는 꽤나 해묵은 논쟁이다. 세계적으로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의무화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전거분담률이 높은 네덜란드, 덴마크 역시 헬멧착용은 자유다. 이들 국가에서 자전거이용자들의 헬멧착용률은 약 10~20% 수준이다. 단, 어린이는 예외다.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는 측의 주장은 이렇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상해 부위는 대부분 머리다. 머리를 보호하면 자전거사고 사망률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맞고 또한 사실이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자전거사고 사망자 수는 265명이었다. 이중, 머리 상해로 인한 사망이 59%를 차지하였다. 자동차운전자의 경우가 25%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결국,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만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자전거 이용자에게 헬멧을 강제하는 당위성이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자전거교통사고 피해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한다는 문제가 있다. 자전거사고 사망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은 자동차가 가해자이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제2 당사자의 비율이 자전거사고의 경우에 제1 당사자보다 3배나 높다. 다시 말해, 자전거이용자는 자동차에 의해 당하는 것이다. 잘못은 자동차 혹은 인프라 때문인데, 왜 피해자가 불편을 안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둘째, 헬멧착용 의무화의 효과성이다. 1990년부터 의무화한 호주는 의무화 이후 적게는 22%에서 많게는 60%까지 자전거 이용률이 낮아졌다. 또한, 헬멧을 착용하여도 사망을 방지할 확률은 29%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즉, 자전거 이용률과 강력한 마이너스 상관성이 있으며 효과도 보장하지 못한다면 편익보다 비용이 크게 되는 것이다.
셋째, 형평성 문제이다. 머리 상해로 인한 사망은 자동차사고도 마찬가지다. 머리만 보면 25%이지만 헬멧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얼굴까지 포함하면 42%가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는 것이다. 보행자사고도 40%가 머리 손상이다. 그렇다면 자동차운전자, 보행자에게도 헬멧을 씌워야 하지 하는가?
이러한 딜레마와 자전거 이용률과의 상관성으로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지자체에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다행히,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 결정은 지자체의 몫이다. 법은 지키되 방향은 지자체가 정하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치사율이 높고 운전이 미숙한 어린이나 빠른 주행을 선호하는 이용자그룹, 자전거전용도로, 상충 위험이 높은 구간 등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분명한 것은 자전거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자전거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전거 인프라와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전거사고는 자동차 중심의 패러다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자전거 헬멧 의무화가 교통정책 전반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