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송기한 대전대 교수 |
표절에 대한 유혹은 누구나 한번쯤은 갖게 된다. 그렇다면 학자나 학생들은 왜 이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승진을 한다든가 학위를 받으려면 논문을 써야 한다. 또 연구비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논문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학자라면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논문과 책을 써내야 한다. 그것이 학자로서 가져야할 최고의 품격이자 이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공부란 누구에게나 하기 싫은 영역이다. 하지만 연구 업적은 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남의 글이나 생각을 슬쩍 훔치고 싶은 충동이나 유혹을 쉽게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은 개인의 일탈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에서도 찾아진다.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문(文)에 대한 숭상 의식이 그 하나이다. 이 관념이 고려 시대 무신 정권을 탄생시킨 근본 배경이 된 것은 잘 알려진 일이거니와 그러한 전통은 조선 시대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무(武)를 경시하고 문을 우대하는 통치관념이 주자학적 질서의 근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단면은 조선 후기 박지원의 '허생전'에도 잘 나타나 있다. 허생은 집안 식구들이 아사 직전에 있음에도 책만 읽었고, 그가 책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가난을 구제할 책임을 면제 받았다. 아무도 경제적으로 무능한 허생을 비판하지 않은 것이다.
고려와 조선 시대부터 시작된 문에 대한 숭상과 책에 대한 존엄한 자세들은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한 사례의 한 단면은 향가를 연구하면서 자칭 국보 제1호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양주동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동은 조선인으로서 향가(鄕歌)를 처음 연구한 사람인데, 우선 그 연구 동기가 독특했다. 평양 숭실전문학교 영어 교수로 재직하면서 마땅히 할 일이 없었던 그는 평양 시장판을 돌아다니면서 장기 훈수 등을 두는 것으로 소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심심하던 차에 숭실학교 도서관에 갔고 거기서 경성제국대학논문집이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펼쳐보니 거기에는 오쿠라 신페이(小倉進平)의 향가 연구가 수록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이후 조선인이 시도한 모든 향가 연구들이 그의 아류에 불과할 정도로 대단한 성과물이었다. 어떻든 오쿠라의 글을 본 양주동은 많은 충격을 받게 된다. 나라를 잃은 것도 모자라 물론 정신까지도 빼앗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향가 연구에 매진하게 된다.
양주동은 향가 연구를 위해 여러 지인들로부터 많은 책을 빌리게 된다. 그런데 '심심한 차원'에서 시작했던 그의 향가 연구는 책을 빌리는 과정에서 윤리적 무딘 감각을 드러내게 된다. 그는 자신이 빌린 책은 돌려주지 않고, 자기 책은 남에게 절대로 빌려주지 않는 이상한 포즈를 취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절도 행위이지만 당시의 풍토에서는 이런 윤리적 일탈이 어느 정도 용인되었다고 한다. 책에 대한 숭고성이 윤리적 감각을 무디게 했던 전형적인 사례였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책에 대한 숭고성은 책 도둑에 대해서도 한없이 관대한 일상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식이나 책을 남몰래 가져가는 것은 윤리를 넘어 범죄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지식의 숭고성으로 윤리를 무디게 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법적 책임이 있어야 그 사멸된 윤리적 감각이 날카롭게 깨어나는 환경이 되는 것일까. /송기한 대전대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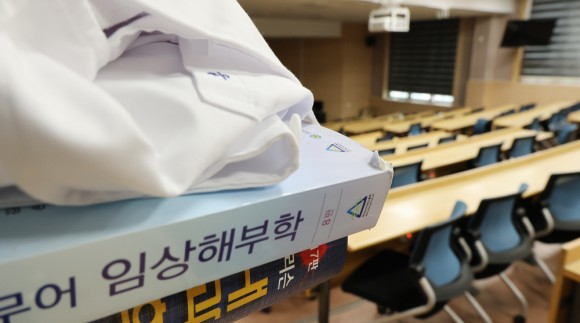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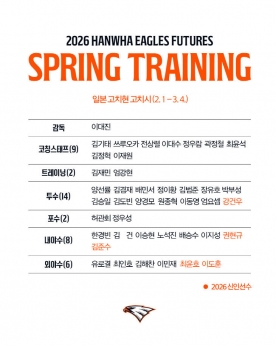

![[대전 체육인을 만나다] 대전고·한밭중 야구부 김의수·김종국 감독, `미래 야구 유망주들을 위해 최선을`](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1m/31d/20260129010022542000922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