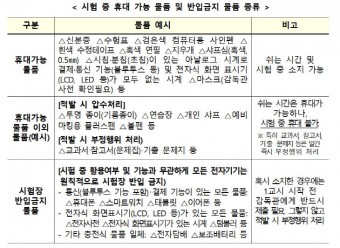|
| 김용성 충남대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들은 '인생을 바꾸기 가장 적기'에 있는 사람들이고, 둘째, 예상보다 궁금한 것이 많아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강연 후 질문이 전혀 없으면 '내가 강의를 잘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학생들과의 만남은 늘 나에게 큰 활력소가 된다.
요즘은 AI 시대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AI 활용 실태는 어떨까? 강연 중 "AI를 써본 적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금세 현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AI를 써봤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챗GPT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성형 AI는 만 18세 이상 사용을 권장하지만, 만 13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AI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며, 학생들은 다양한 우회 방법으로 손쉽게 AI를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하는 전용 앱이 있다. 이 앱을 쓰면 자녀의 위치, 앱 사용 시간 등을 부모가 직접 확인하고 제한할 수 있다. 왜 이런 제어가 필요할까? 성인조차 스마트폰을 절제하기 어려운데 청소년들은 그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늦게 접한 아이일수록 학습 태도가 좋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학업 성취도는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결국 스마트폰은 장점도 있지만,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현명하게 활용하는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학습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도구로 사용하는 청소년보다 SNS나 게임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이제 스마트폰과 비슷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다. 최근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 관리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한 10대 청소년이 챗GPT의 조언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나온 조치다. 청소년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 AI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7월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영국 청소년(15~18세)의 77%가 숙제를 하기 위해 AI 도구를 사용했다고 한다.
청소년 대상 연구는 아니지만, MIT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챗GPT를 활용해 에세이를 쓴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것이다. 결과는 명확했다. 챗GPT를 사용한 그룹은 뇌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기억력 저하와 게으른 경향을 보였다. 한마디로 뇌가 '회색빛'으로 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이처럼 AI는 우리의 사고 과정을 점점 굳게 만들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청소년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닥친다. 스마트폰 노출이 학습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처럼, AI에 조기 노출된 청소년들은 학습 태도뿐만 아니라 인지력·기억력 등 전반적인 뇌 기능에서 퇴화를 겪을 수 있다.
이제 우리 지역 청소년 교육도 달라져야 한다. 이들에게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학생들이 멈출까? 결코 그렇지 않다. AI도 이와 같은 문제이다. 이미 매우 편함을 느끼게 해주는 도구로 인식되었는데, 쓰지 말라고 한다면…. 아마도 몰래 쓰고 있을 것이다.
즉, AI 사용을 단순히 막을 것이 아니라, AI의 장점과 함께 한계·부작용·윤리 문제를 함께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AI 리터러시 교육과 윤리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때다. /김용성 충남대 사범대학 기술교육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