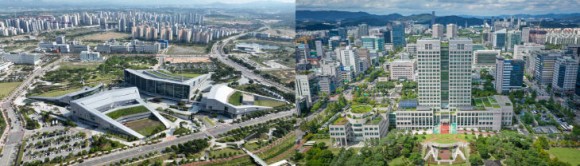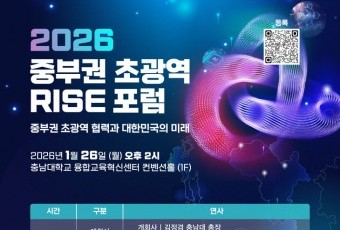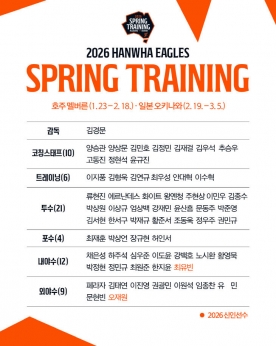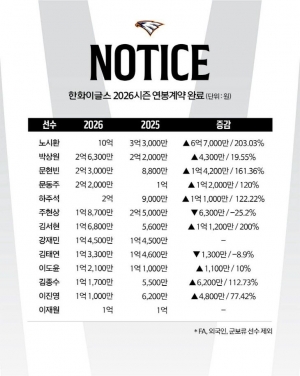|
|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다만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에 따라 국정감사의 시작 시 인사를 하러 나왔을 때, 국회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절차 등에 관한 질문을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의 독립'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의 독립'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떤 정도로 지켜야 하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변호사인 필자는 직무상 법원의 판결을 자주 접할 수밖에 없으며, 필자는 법원이 높은 수준의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 신뢰할만한 국가기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이 신뢰할만한 국가기관이라 하여 이것이 논리필연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그 자체로 무결점·무오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관 역시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어떤 일이든지 실수나 감정, 때로는 이해관계까지도 개입되며 오류를 낳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법원은 스스로 오류의 가능성을 자인하며 번거롭더라도 한 번의 재판이 아닌 세 번의 재판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심에 비해 2심을, 2심에 비해 3심을 상대적으로 더 결점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 체계는 1심보다 2심을, 2심보다 3심을 더 신뢰해 상급심이 하급심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종결하지 않고 무한히 다투게 내버려 두면 사회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누군가는 최종 판단을 하여야 하며, 우리 헌법질서는 대법원에 다툼의 최종 판단 권한, 즉 '싸움 종결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의 승패는 대법원이 판단하면 그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종결되어 버린다.(물론 탄핵, 권한쟁의, 위헌법률 등 일부 문제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종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대법원의 판단을 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신체적·재산적으로는 받아들여야만 한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대법원 판결에 심적으로 납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체가 구속되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가령,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가 지지하는 또는 국민 절반 정도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가정해보겠다. 국민 중 甲은 대법원 판결이 사법의 독립 침해가 아니라 '정치화된 사법'을 올곧게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하자고 하는 반면, 다른 국민인 乙은 '사법의 독립'을 이유로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벌어질 것이다.
법원 역시 국민들의 감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할까, 받아야 한다면 '사법의 독립'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감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할까. 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명쾌한 입장을 정리해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사회적으로 벌어질 다양한 일들을 지켜보며 조금씩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