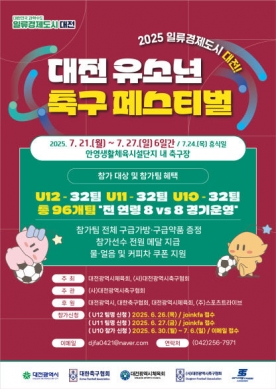충발연 환경생태연구부 정옥식 책임연구원은 11일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충남리포트 98호)'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원은 “현재 고병원성 AI의 보유숙주가 야생조류라고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며 고밀도로 사육되는 가금류에서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내 AI 발병의 주요 특성인 반복적·중복적인 발병 통제선 밖의 빠른 확산 AI에 따른 야생조류의 폐사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예방 및 사전 모니터링에 중점을 둔 AI 관리 체계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 설정, 통제초소 설치, 살처분 등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내 AI 발병 시 통제선과 방역지역 밖에서 재발한다”며 “이는 AI의 잠복기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AI 발병 단계 이전에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가금류 농장을 대상으로 위험군의 전수 조사와 무작위 추출 등 중복적, 정기적(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금류의 혈액조사, 시료 분석을 통해 발병 유무를 체크하는 등 AI 발병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정 책임연구원은 “최근 고병원성 AI에 감염·폐사한 가창오리, 큰고니, 큰기러기 등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또한 철새 분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야생조류가 고병원성 AI를 옮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AI의 국가 간 전이는 명확하지 않지만 국내에서 야생조류가 고병원성 AI를 지역 간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금류의 병원(病原)이 야생조류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함은 물론 조류서식지에 대한 방제(특히 항공방제)는 조류 분산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책임연구원은 “AI 예방은 농가에서 실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하고, 2~3중의 병원(病原)차단벽 형성 등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금류 모니터링은 그룹별, 지역별, 위험요소별로 구분하여 다원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중복 발생한 위험농가에 대해서는 '출하허가제'실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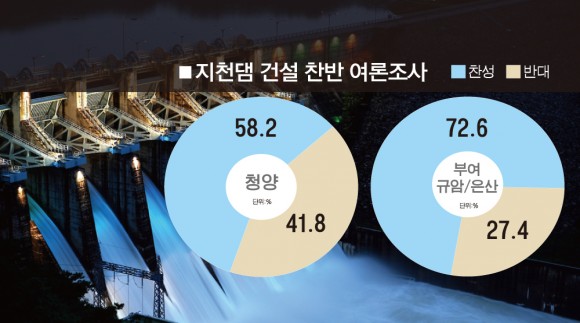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2. 대전 서구 도안동 카페](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7m/16d/78_2025071601001338400057201.jpg)



![[박현경골프아카데미]스크린 골프장 주인이 회원들과 내기 골프를 쳤다는데.. 결과는?](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7m/08d/85_20250708001746512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