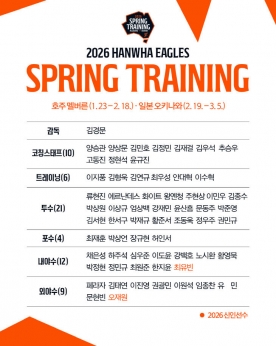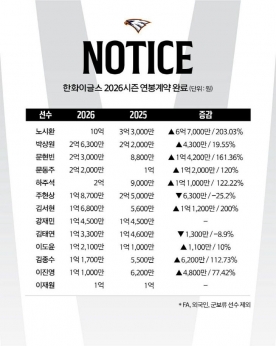|
이동하며 살던 수렵채취경제에서 물질적 부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일 뿐이었을까. 그때 못 푼 석기시대 경제학의 수수께끼를 인류학자 마셜 살린스가 풀어줬다. 재물이 없어 오히려 빈곤하지 않다는 역설이었다. 물욕, 소유욕이 희박한 비경제인들은 욕구도 쉽게 채워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넘보는 우리보다 가난했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노동시간이 짧고 나름의 방식으로 여유를 즐겼을 수렵채집인들에게 성장률 1%는 개미 한 마리의 가치도 없을 것이다.
문명화 세계에선 다르다. 성장률 1%는 복리 개념처럼 부풀어오른다. 1930년부터 80년간 유럽 국민총생산 규모는 4배 커졌다. 어림하여 연평균 1.8% 성장일 텐데 이 정도다. 만약 2.8%씩 매년 성장했으면 경제규모는 8배 이상이었다. 미래가치=현재가치×(1+성장률)×기간이라 해두자. FA=PV×(1+r)×t. GDP를 100으로 잡고 성장률 3%가 지속되면 40년 후 326으로 3배 이상 커진다. 8%면 10년 만에 규모가 2배 이상(216)이 된다. 우리가 경험한 1966년 12%, 1967년 9.1%, 1968년 13. 2%, 1969년 14.5% 등의 고도성장 릴레이는 궁핍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희망의 숫자였다.
그 시절의 우리처럼 성장에 따른 낙관적 기대는 중국, 인도 등 이머징 마켓(떠오르는 신흥시장)에 속한 나라가 높다. 일본, 싱가포르 등 성장이 둔화된 국가는 기대치가 낮다. 한국은 그 중간쯤이다. 경제성장률 1%가 증감하면 일자리 5만 개가 늘거나 줄기도 한다. 다행히 올해의 경제성과인 성장률은 3년 만에 3%대 복귀가 확실시된다. 해외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도 2.8%에서 3.8%로, JP모건이 2.9%에서 3.2%로 상향했다. 한국은행도 0.2% 높여 3.2%로 조정했다. 반가운 신호다.
IMF 사태를 겪은 지 20년, 그 사이 경제규모는 3배 커졌으나 중산층은 사라지고 서민 삶은 팍팍해졌다. 더 힘들
 |
| 최충식 논설실장 |
하지만 근거 없는 낙관은 병이다. 외환위기 한 달 전,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썼다. "우리도 그런 충격파 속에 함께 놓인 것으로 생각했지,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로 치닫는 길에 들어섰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IMF 환란으로 경제주권을 잃기 20일 전,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기초(펀더멘탈)가 튼튼하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 20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은 5년 안에 경제 위기가 닥친다는 경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잘나간다고 어물어물 대응하고 경제적 역동성을 되찾지 못하면 위기는 또 찾아올 수도 있다. 11월 21일, 그냥 그렇게 쉽게 잊혀도 되는 날이 아니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