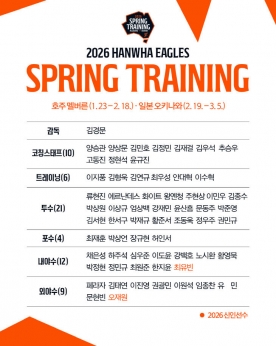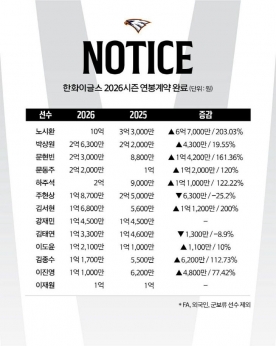|
불안정한 독립을 이룬 '비혼 단신 노동자'가 지난 세밑에 화제를 뿌리며 새해를 맞았다. 30세 미만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1000원이지만 77만원 세대라 한 것은 88세대와 짝을 맞추기 위해서다. 일부의 극단적인 저소득 상황이라 해도 77만원 세대, 88만원 세대가 상징하는 것은 고용 불안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도 이미 77만원 세대라는 말과 현상이 실재했지만 모른 체했다. 시기적으로 연평균 7퍼센트 성장, 10년 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강국 진입 공약이 허구로 판명된 뒤였다.
일을 해도 가난한 청년 워킹푸어의 새삼스러운 재조명은 고용의 안정성, 최저임금,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이슈를 던져준다. 해가 바뀌자마자 시급 7530원의 후폭풍을 다독이려고 30인 이하 고용 사업체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접수를 받고 있는 다른 한쪽에서 알바생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난을 걱정한다. 최저임금의 충격을 고용 감소로 흡수하려는 경향은 어디에나 있다.
|
최충식 논설실장 |
원래 '88만원'은 비정규직 평균급여 119만원에 20대 평균급여인 73%를 곱한 금액이었다. 4400만원이던 시급 기준으로 10시간씩 20일 일해야 버는 돈이기도 했다. 그 패턴이 숫자만 바뀐 채 지속된다. 시급이 해마다 올라도 정보화 기술이 중간 일자리를 만성적으로 삼키고 있는 것이다. 아주 단순히 봐서 AI(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려면 AI가 시키는 일을 준비시키든지 AI에게 일을 시키든지 둘 중의 선택인데 여전히 붕어빵 교육을 한다. 바다표범의 위협에도 4차 산업혁명의 바다에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린다.
물론 고용 증대는 물가 안정과 함께 거시경제 정책의 양대 목표다. 아무리 그래도 예산을 펑펑 부어 만든 인위적인 공공 일자리보다 기업이 고용해야 지속성장에 유리하다. 이면의 그림자를 보면 소득 5분위(최상위 20%) 청년가구 소득은 거의 소득 1분위(하위 20%)의 10배로 벌어졌다. 청년 소득도 양극화다. 연봉 968만원인 일하는 빈곤층의 불완전 고용을 헤아려야 한다. 이들의 경제적 삶은 관태기(관계의 권태기)가 부추긴 솔로 이코노미(1코노미)와는 뿌리부터 다르다. 외로움을 수익화해 가정을 찾아 요리, 식사, 대화를 해주는 일본의 와쇼쿠야(話食屋) 서비스나 '나홀로 볼링' 현상 같은 선진국의 사회적 연대 붕괴와 비교 대상이 못 된다.
파편적인 노동 끝에 혼밥, 혼술도 사치인 '밥이 없는 삶' 속의 청년을 표피적으로 보면 답은 없다. 200장의 이력서를 쓰면서 한 주, 한 끼 밥벌이에 찌든 저임금 청춘에게 어떻게 결혼과 출산을 권유하며 어떻게 공동체를 강조하는가. 공공 부문, 구호성 사업에 쏠린 청년취업 대책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소득빈곤과 주거빈곤, 시간빈곤에 빠진 대한민국 신빈곤층의 깊은 절망을 응시해야 하는 무술년 새해다.
최충식 논설실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