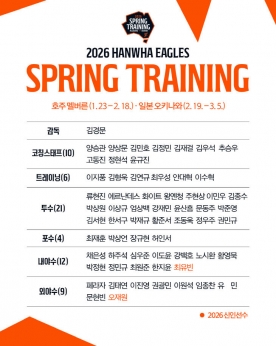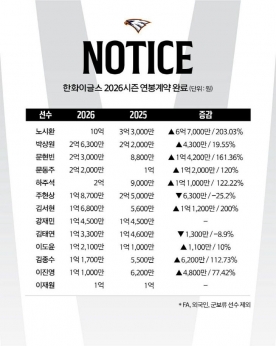|
많은 사례 중 G20 서울 정상회의를 먼저 짚어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그 경제효과를 쏘나타 100만대 수출액과 맞먹는 21조~24조원대로 잡았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본부는 450조원 넘게 추산했었다. 이틀간 국제회의 효과가 한국 GDP 절반이라는데 검증은 어렵다. 영화 '어벤져스 2'의 한국 촬영 효과 2조원 논란도 거셌다. 누구 몫의 경제효과인지 팩트 체크가 아예 곤란하다.
돈 쓰는 쪽을 생각하지 않아 늘 문제다. 더 생생한 사례가 남북 회담의 물꼬를 터준 평창동계올림픽이다. 연간 GDP 0.05~0.06% 상승효과를 청와대가 내다본 지 딱 두 달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강원연구원은 20조원 내지 65조원의 효과를 점쳤다. 경기장과 선수촌 공사 등의 직접효과, 한국 상품의 미래 예상 수입을 합친 간접효과는 환상처럼 빛났다. 그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누가 버는가.
강원도 입장에서는 다른 데 쓸 돈을 경기장과 선수촌 건립에 끌어다 썼다. 개인이 평창으로 관람을 떠나 다른 데 돈을 못 쓴다면 국가 전체의 산술적인 효과는 불변이다. 국내 글로벌 기업의 인지도 상향에 드는 광고비를 역산해도 매일반이다. 평창올림픽을 한 번 찾은 관광객이 도쿄나 베이징으로 간다면 관광 유발은 도루묵이다. 경제효과가 이벤트 홍보 수준일 때가 허다하다. 연휴 경제효과도 그런 측면이 있다.
안타깝게도 평창에 '올림픽의 저주' 비슷한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지난달 패럴림픽까지 잘 마친 강원도는 경기장 13곳 중 강릉오벌 등 4곳의 국가 관리를 요구한다. 어제는 항구적 겨울스포츠 산업의 성장이 부각되더니 오늘은 후유증을 안 짊어지려 안간힘이다. 1000억원이 들지 모를 가리왕산 복원도 효과 계산에서 빠졌다. 올림픽만 치르면 고소한 참기름 공장이라도 차릴 듯이 떠들던 사람에게 책임지울 수도 없다. 처음부터 아니면 말고였다.
'남북통일이 주변 4강에 미치는 편익비용.' 이런 분석에 한바탕 실소한 사실이 있다. 밤새 계산기를 두드려도 중국의 GDP 50조원 증가와 고용 564만명 창출을 증명할 길은 없었다. 크기가 중국>러시아>미국>일본 순인 통일 이득도 안 닥쳐봐서 모른다. 평창올림픽도 평창, 강릉, 정선의 소도시, 소멸지 브랜드 승화에 들뜬 지 엊그제인데, 강원도개발공사는 현실의 손실 보상과 소송 불사를 이야기한다.
악마는 또 디테일에 있었다. 앞으로는 거창한 책상 정치를 피하고 치밀해져야 한다.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 전후로 주가는 11% 이상 떨어졌다. 지금 증권가는 연간 80조원의 시장 확대 효과를 내다본다.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커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4월 위기설이 잦아든 것도 효과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는 좀 다르다. 종전 선언과 비핵화를 넘어 국제사회 제재 완화 훈풍이 돌아야 펼칠 수 있다. 기준이 아리아리해 학계 공인도 못 받고 사후평가가 안 되는 경제효과 신기루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겠다.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