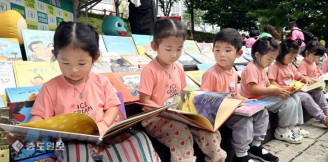|
| 성낙문 세종도시공사 경영본부장 |
그렇다면 일의 진행이 왜 이리 부진한가? 이것은 헌법논란 때문일 것이다. 헌법논란을 잠재울 뚜렷한 방법도 뚫고 나갈 의지도 없었다. 그렇게 십수년을 허비했다. 이건 중앙정치의 문제이고 세종 정치인의 한계이기도 하다. 헌법논란을 정면으로 뚫고 가는 방안은 두 가지, 즉 '헌법에 세종을 수도로 규정하여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방안'과 '행정수도법을 다시 만들어 헌재의 판결을 다시 받아 보자는 방안' 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실행의지가 매우 강했던 노무현 정부에서조차 실패했던 일이다. 이번에도 적지 않은 국론분열을 일으킬 것이고 자칫하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또 한번의 실패는 세종에 회복불능의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네덜란드는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네덜란드 헌법은 제 1도시인 암스테르담을 수도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정부기관은 암스테르담에서 약 60km 떨어진 인구 60만명의 헤이그란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대법원은 물론 의회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국왕과 내각을 총괄하는 수상도 헤이그에서 직무를 본다. 어찌 이것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면 암스테르담이 너무 복잡하여 주요기관들을 헤이그로 옮겼다는 아주 단순한 대답이 돌아 왔다. 누구도 헌법을 들이대며 제동을 걸지 않았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임을 인정하자. 수도권주의자들의 반대는 서울이 갖는 수도로서의 상징적인 지위를 잃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얘기를 하다보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등의 세종이전에 대한 반감은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한곳에 모여 있어야 하는 국가의 주요기관이 멀리 떨어져 발생하는 부작용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헌법이니 뭐니 자극하지 말고 이들 기관들의 완공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이를 위해 빨리 첫삽을 뜨는데 역량을 집중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통령이 세종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면 일의 추진이 훨씬 용이 할 것이다. 그동안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실패 했다. 그 결과, 총인구의 51%, 청년인구의 70%, ICT 종사자의 85%가 수도권에 산다. 또한 정부의 주요기관들이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 있어 우리가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한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다. 세종 행정수도 논란은 이와 같은 망국적인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정부 추석민생안정대책 발표] 10월 4~7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09m/15d/78_2025091501001395500058681.jpg)

![[S석 한컷]리그3위 대전 팬들에게 하위스플릿을 이야기 했더니..](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9m/03d/85_20250903001631492_1.jpg)

![[제16회 동구풋살대회] 열정으로 가득 찬 전국 풋살인들의 대축제](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9m/15d/2025091401001214700051571.jpg)
![[제16회 동구풋살대회] RUN-FC `첫 출전에 우승까지…값진 결과에 감사를`](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9m/15d/2025091501001396000058721.jpg)
![[제16회 동구풋살대회] 정민규 회장 `대회를 준비한 모두에게 박수를`](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09m/15d/20250914010012177000517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