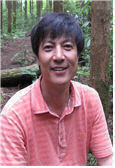 |
| 김홍진 교수. |
쌤통의 심리는 타인의 불행을 보며 죄책감 없이 쾌감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문제는 타자의 불행을 기대하다가 직접 유발하려는 욕망으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다. 나치 시대 광기 어린 집단적 유대인 박해가 한 예다. 인간의 파괴 본능을 죄책감 없이 충족하는 방식이 고소한 쌤통의 심리학이다. 그러나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것을 보며 고소해 하는 감정에 그치고 만다면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고소해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참된 민주주의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정치적 성찰이 필요하다
인류 역사는 악으로 넘쳐난다. 강상중의 이 책은 일상에 내재한 악의 힘을 고찰하는 데 주력한다. 저자는 엽기적인 살인, 잔혹한 테러, 악과의 거래를 통해 무한 증식하는 자본과 조직 논리가 자행하는 범죄에 이르기까지 일상에 만연한 악의 숨겨진 진면목을 응시한다. 그리고는 이런 악이 과연 '나'와는 무관한 것인지 묻는다. 세간을 경악케 한 내란과 같은 악행은 과연 광기와 음모론에 사로잡힌 한 집단이나 악인에 의한 것일까? 강상중의 통찰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환기하기도 한다. 악은 우리의 보편적 무의식과 일상에 편재한다.
강상중은 엽기적 살인이나 잔학무도한 테러, 시스템 속의 얼굴 없는 악 등 여러 끔찍한 악행들을 따라간다. 여기서 자연스레 최근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광기 어린 악행과 악의를 떠올리게 된다. 세월호 참사, 강남역 살인사건, SPC나 김용균, 국정 농단, 내란 사태가 보여주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추악한 행태와 치밀한 범죄들 말이다. 악의 시대라 해도 무방할 경악스러운 일이 하루가 멀다 벌어지지만, 우리는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만 할 뿐이다. 우리는 악행이 광기에 사로잡힌 한 인간이나 집단의 일로 치부하고는 나는 안전하다 안도하고 위안할 뿐이다.
강상중은 또 인간이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 공허함을 품은 존재인 한 악의 출현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으로 '성서'를 비롯한 '실락원', '파리 대왕', '파우스트 박사', '카라마 조프가의 형제들', '변신' 등등 여러 소설을 통해 인간이 품은 넘쳐나는 악의 표상을 포착한다. 악은 존재론적 공허함,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 특히 내란의 사례처럼 특권적이며 중독적 자기인식이나 나르시시즘 속에 깃든다. 하지만 이런 악을 향한 우리의 분노 역시 용서 할 수 없다는 감정 하나로 묶여 있다. 무소불위 호가호위 권력을 휘두른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으로 소환되는 사태에서 대중이 느끼는 감정도 이와 같으리라.
강상중은 우리에게 악이 왜 발생하는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양한 논점을 제시하며 사유의 물꼬를 터준다. 그 결과 우리가 사회에 절망하면서도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인간을 믿고 스스로를 세상의 일부라 느끼는 공생의 철학과 실천 윤리학 외에는 번성하는 악의 시대를 건널 방도는 없다. 꼴좋다는 쌤통의 심리보다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존재와 이어져 있다는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는 게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일 것이다.
김홍진 한남대 교수/문학평론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