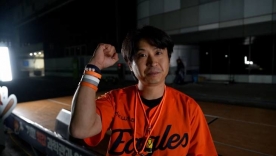|
신문 한 면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손이 닿습니다. 그중에서도 '제목'을 고민하는 편집기자의 손은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움직입니다.
편집부에 입사한 지 1년 3개월. 저는 여전히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빈 화면 앞에 앉아 그날 발행된 신문을 그대로 따라 만들어보며 편집 프로그램을 익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Ctrl+C'와 'Ctrl+V'만 반복하던 날들. 기사 제목과 사진을 배치한 뒤 저장하는 법조차 몰라 멈춰 선 적도 있었습니다.
지면을 직접 만들기 시작한 뒤에는 선배들이 툭 던진 말이나 흘린 단어 하나까지도 전부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낯선 단어와 한자가 많아 국어사전 사이트를 틈날 때마다 찾아보고 익혔고 그렇게 하나씩 익혀갈수록 이 일이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제가 만든 편집이 지면에 실리고 그 신문이 다음 날 독자의 손에 닿는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처음 쓴 제목이 그대로 반영된 날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지면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며 괜히 어깨를 으쓱했고 반대로 많이 바뀐 날엔 혼자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제 제목이 제법 살아남습니다.
그럴 때마다 편집기자로서 조금은 '인정받고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스스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더 배워야 할까?"
제목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제목이 괜찮다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어색하거나 과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기사를 두고도 누구는 A를 누구는 B를 선택합니다.
결국 편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독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스스로 묻습니다. "이 제목,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까?", "기사를 읽지 않아도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 물론 감정 소모도 있습니다. 제목이 반려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수정이 들어올 때면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이건 좀 어색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아는 단어와 감각으로 최선을 다해 만든 문장이 가볍게 느껴져 속상했던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단어 하나의 무게와 어휘가 주는 감각, 문장 배치의 미묘한 차이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편집기자는 '언어의 마술사'라는 말도 있지요. 같은 뜻을 전해도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강도와 온도, 감정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시동', '탄력', '발돋움' 모두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뜻이지만 '시동'은 정책적이고 선언적인 느낌, '탄력'은 추진력과 가속, '발돋움'은 조심스럽지만 위로 향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감각을 익히고 고르는 일이 저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여전히 단어를 붙잡고 고민합니다.
오늘도 저는 제목을 짓고 다듬습니다. 짧은 문장 한 줄로 독자가 '아'하고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기억에 남는 제목이 있었다면 그건 어떤 편집기자의 하루가 조금은 당신에게 닿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닿음'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덜어내고 다시 다듬으며 배웁니다. 독자 한 사람의 시선과 마음에 닿기 위한 조용한 연습을 계속합니다.
안희연 편집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안희연 기자
안희연 기자
![[꿀잼대전 힐링캠프 2차] 캠핑의 열정과 핼러윈의 즐거움이 만나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1m/03d/118_2025110301000092200003001.jpg)